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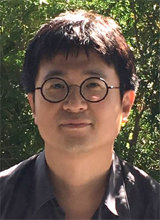
딸이 방을 못 갖게 된 사연은 이랬다. 집을 지으려고 산 땅에는 두 채의 집이 들어서 있었다. 지붕 하나에 집 두 채. 우리 집을 지으려면 옆집 지붕을 잘라야 했다. 그 집도 살리긴 해야 해서 조심조심 지붕을 최소한으로 잘랐더니 아이들 방으로 계획한 2층이 생각보다 작아졌고, 결국 문도 달 수 없는 크기가 되어 버렸다. 인테리어 전문가와 상의해 원목으로 만든 2층 침대를 짜 넣었고, 아래 칸을 옷장으로 만들어 넣을 때만 해도 그럭저럭 잘 마무리된 줄 알았다.
평화를 깬 건 소리였다. 문이 없다 보니 내가 통화하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아이 귀로 직진했다. 하필 화장실도 같은 층에 있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아파트를 떠나면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이건 뭐라고 해야 할까. 가족 소음? 사춘기 때는 한 번씩 문도 쾅쾅 닫고 그러면서 또 느끼는 바도 있는 법인데 그럴 문 자체가 없으니 원. 이런 문장을 볼 때도 안쓰럽다.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다. 진정한 기쁨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만 깃들기 때문이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다.
그렇게 조금만 더 큰 공간과 집을 바라게 됐는데…. 아, 서울의 집값은 로켓이라도 탄 듯 저 높이 가 있다. 누군가 작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이 조언을 꼭 해 주고 싶다. “아무리 작아도 방에 문은 달 수 있어야 해요. 소파는 없어도 문은 있어야 합니다. 귀도 행복할 곳일지 잘 따져 보세요.”
정성갑 한 점 갤러리 클립 대표
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5월을 즐기기에 제격인 한옥[공간의 재발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5/14/10691491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