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통은 오로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의 것이다. 남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느끼고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고통이 나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 고통에도 일종의 소유권이 있는 셈이다. 남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다.
2020년에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 계약’이라는 논문을 쓴 미국인 학자 마크 램지어의 문제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겸손함은 물론이고 공감 능력마저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는 한국인 ‘위안부’의 행위를 계약에 의한 매춘으로 일반화하면서 고통 속의 타자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의 모습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했던 일본 식민 사학자들을 닮았다. 위당(爲堂) 정인보의 ‘정무론(正誣論)’을 보면 식민 사학자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그들은 한반도 북쪽이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으로 단정했다. 평양 인근에서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그런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위당에 따르면 그것은 유물을 조작한 결과였다. 그들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숨겨 버리고 고쳐 버리고 옮겨 놓고 바꾸어 버리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했다. 정해진 결론으로 몰아간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한반도 북쪽을 중국이, 남쪽을 일본이 식민 지배했다는 논리를 펴서 한민족의 역사를 찢어 놓고 자기들의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위당의 ‘정무론’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거짓(誣)을 바로잡는 글”이었다.
왕은철 문학평론가·전북대 석좌교수
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새는 자유로울까[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190〉](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4/28/10664491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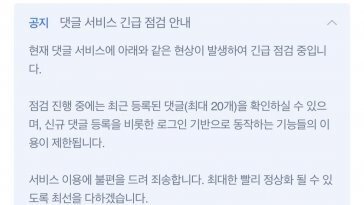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