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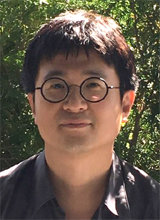
집에 딸린 한 뼘 정원(정원이랄 것도 없는 작은 공간이지만)을 포함해 여러 채널을 통해 직간접으로 정원을 경험하다 보니 이 크고 작은 꽃밭이 무척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땅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뜻 봄의 화사함과 여름의 무성함만 떠올리지만 가을의 고독과 겨울의 죽음도 순리처럼 따라붙는다. 누군가 정원을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꽃이 진 자리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포함해 다수의 정원 에세이를 내고 흙 만지는 일을 좋아했던 헤르만 헤세는 “가장 무상한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심정에도 정원의 가을과 겨울의 시간이 녹아 있다. 생로병사가 함께하고, 채움과 비움이 공존하고, 들여다본 만큼 건강한 얼굴을 보여주고, 행복이기도 했다가 선생이기도 했다가 그저 무위(無爲)이기도 한 것. 정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개인적으로도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 지난해 작은 집을 지어 이사를 오면서 한 뼘 정원이 생겼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정원이라 한껏 욕심을 부려 평소 좋아하던 백일홍과 산당화, 라일락 두 그루를 심었다. 주변으로는 장미와 남천도 가져다 두었다. 그렇게 정원을 빽빽하게 채워 놓고 작년 한 해 잠시 기뻤는데 올해는 영 별로다. 산당화와 라일락 가지가 뒤엉켜 지나다니기가 불편하고 가지를 높이 뻗어 올린 장미 밑에 캠핑 의자를 두고 앉으려니 가지에서 혹 송충이가 떨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돼 마음이 편치 않다. 정원과 조경의 고수들이 왜 채우기보다 비우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지 알겠다. 김용택 조경가의 말에도 수긍이 간다. “정원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욕심을 안 내는 일이에요. 어떤 곳에 가면 나무를 너무 빡빡하게 심어 놔 답답해요. 사계절을 생각해 조경을 해 달라는 분도 많은데 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사계절은 다 볼 수 있어요. 잎이 올라오고, 무성해지고, 떨어지고, 앙상해지는 모습이 사계절인 거잖아요.” 정원에도, 인생에도 ‘공백’이 필요하구나. 요즘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이다.
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
구독 24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134
-

횡설수설
구독 283
-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구독 23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1개
![식탁을 가장 좋은 곳에[공간의 재발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6/25/107630665.1.jpg)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보도 완장을 만든 이유[오늘과 내일/장원재]](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188867.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