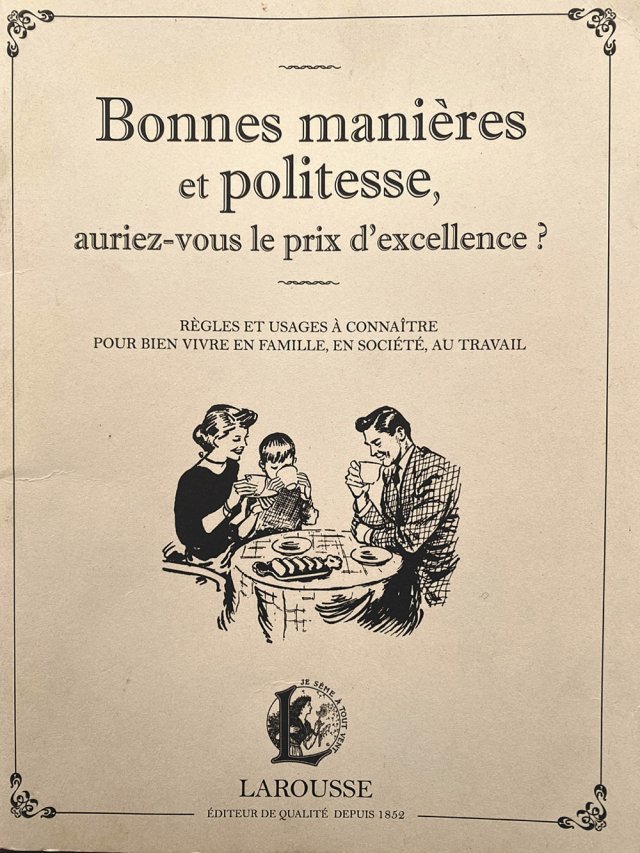

프랑스 레스토랑은 관광 명소처럼 표지판을 세워 두지는 않지만 엄연히 복장과 관련한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 슬리퍼나 운동화는 피해야 한다. 프랑스에 출장 또는 여행을 와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가 문전박대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예약할 때 별도로 안내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춰 입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옷차림은 과도한 노출을 피하는 세미 정장이다. 고급 유람선이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재킷을 대여하기도 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국내 톱클래스 배우와 함께 파리 시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식사에 동행한 적이 있다. 항공사 측 실수로 정장이 들어 있는 가방이 도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캐주얼 차림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입장이 거절돼 인근 의류 매장에서 옷을 사야 했던 경험이 있다.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들은 왜 비싼 음식값을 지불하는 고객들의 옷차림에 그리 민감할까? 그건 클래스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격식을 갖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선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에티켓 문화도 있다.
한국 여행자에게 무엇보다도 곤혹스러운 것은 식사시간이다. 시차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식사하다가 포기하고 먼저 일어서는 분들이 많다. 2차 문화가 없는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에선 최소 두세 시간 이상 걸리는 20여 개 코스 요리가 이어진다.
그렇다고 세계적인 셰프들이 내놓는 미식의 향연을 즐기는 데 망설일 필요는 없다.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포용심과 예술에 가까운 프렌치 테이블이 주는 감동은 남다르다. 이를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천국과도 같은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정기범의 본 아페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HBR insight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우유로 키우는 브레스 닭[정기범의 본 아페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7/14/10796000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