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벽한 독점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 만난 금융사 임원 A 씨는 규제 환경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플랫폼인 카카오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반면에 빅테크들은 혁신 서비스로 지정돼 느슨한 규제를 받거나 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있다는 불만이었다. 그는 “결국은 고객과의 접점 싸움이다. 독점 플랫폼이 있다면 계열에서 떼어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분위기를 모르면 A 씨의 ‘빅테크 해체론’이 혁신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 패자의 하소연이나 현실성 없는 과격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빅테크 발상지인 미국에선 생각보다 현실에 더 가깝다. 올해 6월 미 하원에선 플랫폼 반(反)독점 법안 5개 중 하나인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빅테크 서비스가 사람들의 삶에 들어온 이후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진 건 사실이다. 2008년만 해도 1분에 850원을 주고 국제전화를 해야 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찾고 긴 비밀번호를 매번 쳐 넣던 번거로움도 간편결제 서비스 등장 이후 사라졌다.
빅테크 역시 그 혁신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손쉽게 사업을 확장하고 수수료 수입을 챙긴다. 카카오페이 매출에서 펀드, 대출, 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4%에서 올 상반기 32%로 급증했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빼놓고 이런 급성장을 설명하기 어렵다.
혁신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킨다면 더는 공짜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경쟁 부족으로 초래된 높아진 가격과 낮아진 임금은 미국 중위층 가계에 매년 5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미국에서 사업 분리 법안까지 발의된 데는 소수의 빅테크에 유리한 경제력 집중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부동산팀의 정책워치
구독
-

사설
구독
-

박중현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박훈상]尹 방탄하는 국민의힘… 간판에서 ‘국민’ 떼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17/130667261.1.jpg)
![‘레이디 맥베스’에 김 여사 빗댄 더타임스[횡설수설/김승련]](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67375.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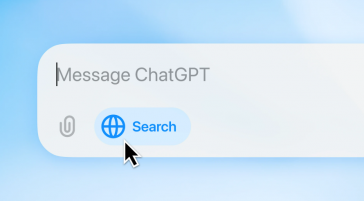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