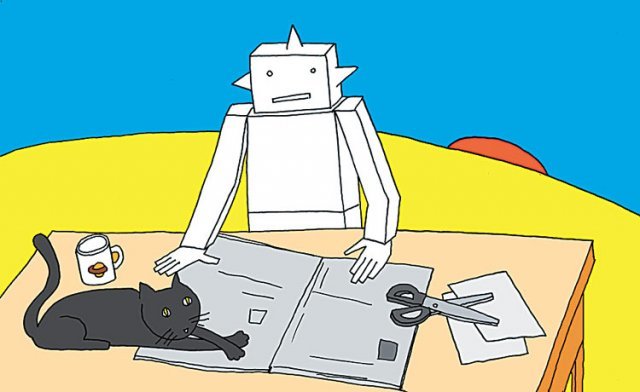

주말에 신문 읽는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이 좋다. 가장 편안한 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신문을 본다. 신문은 책과는 다른 소리를 낸다. 살짝 흥분시키는 휘발성 기름 냄새도 있다. 넘기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가 신문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신문 읽기는 뒤에서부터 시작한다. 신문 앞쪽은 일주일을 보지 않았다고 해도 내용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또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일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띄면 가위로 그 기사를 오려 상자에 쌓아놓는다. 필요할 때 찾아서 다시 본다. 오래되고 색 바랜 기사가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다.
어릴 적 새벽에 배달된 각 잡힌 신문은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했다. 아버지가 보기 전엔 각 잡힌 신문을 절대 만질 수도, 열어볼 수도 없었다. 세월은 흘렀고, 세상은 변했다. 이제 각 잡힌 신문을 3개씩 보는 호사를 누리는데, 예전 아버지가 보시고 난 후 읽던 신문이 더 신문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노벨상 수상자 목록을 보다 보니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띄었다.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인 데이비드 줄리어스 교수. 그의 1997년 네이처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그의 논문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아이디어도 훌륭했다. 제일 매운 고추와 맵지 않은 고추를 대상으로 캡사이신 농도에 따라 흐르는 전류를 측정했고, 매운맛을 느끼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이온 채널 단백질에 전기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그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만 해도 9148번이다. 전 세계 과학자 9148명이 그의 논문을 읽고 영감을 받아 후속 연구를 했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그가 한 과학적 업적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요즘 누가 종이 신문을 읽나, 하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신문이라는 커다란 열린 창을 통해 세상을 호기심으로 보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시간이 느리게 가는 주말 중국집[이기진 교수의 만만한 과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11/04/11008976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