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영향력 커져
막대한 제작비 지원 투자처 역할 하지만
국내 콘텐츠 산업, 하청업체 전락할 우려
미디어 변화 속 생존전략 고민해야

황동혁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3분기 신규 가입자가 438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9월 17일 첫선을 보인 후 전 세계 1억1100만 개의 계정이 시청했는데, 94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은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 공개된 이경미 감독의 ‘보건교사 안은영’과 올 8월에 개봉한 한준희 감독의 ‘D.P.’ 역시 흥행몰이를 했다.
우리가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배급 방식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서부터다. 이 영화는 극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개봉했는데, 일부 멀티플렉스에서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국내에 처음 들어온 것은 2016년 1월이었다. 당시 관련 업계는 가격 측면과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활발한 결합상품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부담으로 한국에서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같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장가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두 편의 영화가 있었다. 조성희 감독의 ‘승리호’와 이용주 감독의 ‘서복’이 바로 그것. 제작비 240억 원을 들인 ‘승리호’는 2월 5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는데, 인기영화 순위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판권으로 310억 원을 지불했고, 제작비 대비 30%가량의 수익을 거두었다. 제작비라도 건지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넷플릭스는 9부작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 2140만 달러(약 252억 원)를 투자했는데, 넷플릭스 내부 평가 지표인 임팩트 가치(impact value)는 8억9110만 달러(약 1조493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웬만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비의 5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투자로 엄청난 흥행수익을 창출한 셈이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K콘텐츠의 경제 효과가 5조6000억 원 수준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국내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게다가 픽사, 마블, ‘스타워즈’ 등 강력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수 보유한 디즈니플러스의 내달 12일 OTT 서비스 개시를 두고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점은 국내 제작자들이 막대한 제작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OTT가 좋은 콘텐츠만 있다면 접근이 용이한 투자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넷플릭스 등에 눈을 돌려 한국의 콘텐츠 제작에 나섬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식재산권(IP)을 대가로 한 이들의 계약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K콘텐츠 개발과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내 콘텐츠 산업이 넷플릭스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영화 판권 계약 형태 중 ‘플랫(Flat·단매 또는 정액 판권) 계약’으로 체결해 극장 개봉을 포기한 다수의 영화를 공개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계약은 해당 콘텐츠가 실제 발생시키는 매출액과는 무관하게 계약 단계에서 결정된 일정 금액으로 계약 기간 동안 판권을 사 오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IP를 양도한 우리 제작진은 K콘텐츠들을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아니면 볼 수 없는 폐쇄적 독점구조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다만 ‘오징어 게임’을 외면했던 국내 영화사와 방송사들이 리스크는 안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넷플릭스 등에 IP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견도 있다.
동아시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동아경제가 만난 사람
구독
-

홍은심 기자의 긴가민가 질환시그널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탄소중립, 속도와 경로도 중요하다[동아시론/이종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10/26/10992769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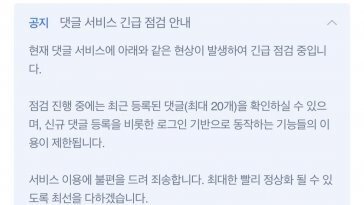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