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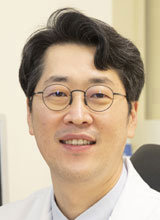
문제는 너무 많은 약이 우리의 삶, 특히 어르신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치료 위주로 세분화된 현대의학에서는 노화마저 질병으로 보며 노쇠함을 병원 치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을 주고 있다.
어르신들은 본래 소소한 증상이 많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병원에 모시고 가기 시작하고,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기 시작한다. 무릎 아프다고 하면 소염진통제, 속이 쓰리다고 하면 위산분비억제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소화제,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면 장 운동 촉진제,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고 하면 뇌 영양제, 혈압이 조금만 높으면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고지혈증약, 중풍 예방 차원에서 혈전예방약 등 수많은 약이 어르신들에게 처방된다. 게다가 몸무게 45kg인 85세 할머니에게 80kg인 20대 청년과 같은 용량의 약이 처방된다.
한번은 잘 아는 어르신이 약에 대해 물어왔다. 어쩌다 보니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이 15알이 넘는데 꼭 먹어야 하냐는 것이었다. 그분의 약통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동그란 알약이 가득했는데 약 먹다가 배부를 판이었다. 나는 작정하고 어르신에게 세 가지 약만 남기고 모두 끊으라 했다. 그 대신 매일 한 시간씩 무조건 걸으며 운동량을 기록하시라고 했다. 어르신이 꾸준히 걷기운동을 하자 팔처럼 가늘었던 종아리에 근육이 붙고 소화가 잘되기 시작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도 조금씩 떨어졌다. 노인 특유의 우울감도 나아졌다. 그렇게 석 달을 걷자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걷기가 최고의 명약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불행한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는 환자의 병원 밖 생활에 대해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 어르신들에게 정작 중요한 일상생활, 식사, 수면, 거동, 배변, 감정상태, 사고능력 수준, 의지하는 지인, 주거환경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의료 시스템이 관심 갖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약만 준다. 약만 한 움큼 먹다 인생이 끝날 판이다. 어르신들에게 약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삶의 재발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길[삶의 재발견/김범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11/26/110465317.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