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꺾이고 부러지며 제 몸도 못 가누는데, 가을바람 불어대니 어찌할거나.
하얀 눈꽃 머리에 이는 것도 잠시뿐, 여기저기 잎사귀가 강물에 잠기네.
연약한 채 이른 봄부터 싹을 틔웠고, 무성한 줄기엔 밤이슬이 그득했지.
(최折不自守, 秋風吹若何. 暫時花戴雪, 幾處葉(심,침)波. 體弱春苗早, 叢長夜露多. 江湖後搖落, 亦恐歲蹉타.)
―‘갈대(겸가·겸가)’ 두보(杜甫·712∼770)
가을바람에 휘둘리며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 갈대. 그 허약함은 애당초 예견되었으니 일찌감치 싹 트는 바람에 봄바람에 시달렸고, 여름날엔 오밀조밀 무성한 줄기 탓에 밤이슬의 무게가 버거웠다. 머리에 하얀 눈꽃을 쓰는 걸 굳이 영화라 한다면 그 잠깐의 영화나마 감지하기는 했을까. 여느 들꽃처럼 갈대꽃은 그저 혼자 피었다 혼자 지고, 금세 잎사귀는 사방팔방 강물에 잠기고 말 테니 말이다. 갈대의 일생을 곱씹으며 시인은 어떤 위로를 건네고 싶었을까. 갈대여, 뭇 초목 가운데 그래도 그대가 가장 뒤늦게 시들지 않는가. 나 또한 짧은 기간 관직에 머물다 긴 세월 강호에 나앉았지만, 더디게 흐르는 강호의 시간에 잠시 위로를 받는다네. 오랜 소외와 시련의 상처를 떠올리면서 시인은 갈대에게서 동병상련을 느꼈는지 모른다. 지금 이대로 허망하게 세월 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도 서로 공유하면서.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시름겨운 밤배[이준식의 한시 한 수]〈136〉](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11/26/1104652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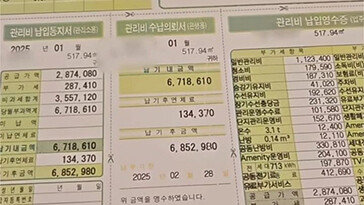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