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으로 KT 첫 우승 이끈 이강철
난세에 주목되는 겸손-소통 리더십

2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난 그의 이름은 돌림자인 ‘빛 광(光)’ 자를 딴 광철이가 됐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삐쩍 마른 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 강(强)철이라고 지었다. 이번 시즌 프로야구 KT를 창단 첫 정상으로 이끈 이강철 감독(55)이다.
며칠 전 기자에게 이런 사연을 털어놓은 그의 선수 시절 별명은 ‘대니 보이’. 곱상한 외모에 착한 심성을 지녔기에 붙여졌다. 그래도 유니폼을 입었을 때 약하지 않았다. 국내 최고의 잠수함(언더핸드) 투수로 통산 최다승 3위, 탈삼진 2위의 기록을 남겼다. 사상 첫 10년 연속 10승의 대기록을 세웠을 때 그는 “감독, 코치님, 동료들이 만들어준 승리”라고 말했다. 아무리 잘 던져도 팀이 0점이면 이길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
화려한 조명을 받는 선발뿐 아니라 중간 계투에 마무리로도 나섰다. “152승에 53세이브, 33홀드입니다. 이런 기록은 흔치 않을 겁니다. 허허.” 웃음에선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흘러나왔다. 2005년 은퇴 후 13년간 코치를 했다. 고향 광주 팀을 떠나 서울 팀에서 수석코치로 후배 감독을 보좌했다. 지도자의 꽃이라는 프로 사령탑은 53세에 시작했다. “고향에만 있었다면 철밥통처럼 자리 걱정 안 했겠죠. 하지만 변화 없이 발전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 흔한 단체 미팅도 하지 않았다. 1군에서 2군으로 강등되는 선수는 감독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격려해주려 했다. 불신의 벽을 허문 KT는 더그아웃에 앉아서 게임을 못 뛰는 선수들까지도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했다.
야구뿐 아니다. “우리는 팀으로서 힘이 센 자동차와 같다. 압둘자바나 조던 같은 선수가 엔진 역할을 하겠지만 바퀴 하나가 펑크 나면 꼼짝하지 못한다. 새 타이어를 갈아 끼웠는데 너트 하나 빠져나가면 바퀴도 빠진다. 파워엔진이 뭔 소용 있겠는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농구부 감독으로 88연승, 10회 우승을 이끈 명장 존 우든이 남긴 명언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 소련에 역전승을 거둔 1980년 레이크플래시드 겨울올림픽 아이스하키 결승리그는 스포츠 역사에서 최고 이변으로 기록된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 ‘미라클’에서 감독은 모래알 같던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름이 적힌) 유니폼 뒤가 아니라 (팀명이 새겨진) 앞이다.”
출근길에 마주하는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 걸린 ‘광화문 글판’이 새로 바뀌었다.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다.’ 새해에는 자신을 낮춘 경청의 자세로 시작해 보자는 의미라고 한다. 입은 닫고 귀부터 열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어떤 조직의 리더라면.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리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성장판 닫힌 제조업 생태계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김승련]한덕수 대행은 왜 탄핵을 자초했을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27/130741985.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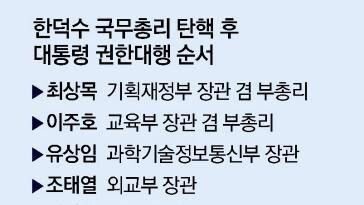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