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극도로 엄격하고 까다롭고 짜증스럽고 야비하고 의심 많은 인간이 되었어.” 62세의 저명한 의대 교수이자 3등 문관인 니꼴라이 스쩨빠노비치는 죽음을 6개월 앞두고 냉소와 환멸에 휘감겨 있다. “문학이나 정치에 코를 박은 적”도 없이 학문의 길만을 걸어왔으며 겸손하고 도덕적인 성품으로 명망 높은 니꼴라이가 왜? 기억력이 가물거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신체적 쇠약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혐오증에 걸린 것이다.
모든 것을 이루어낸 듯 보이는 그의 내면은 좀스럽기 그지없다. 자신이 자질구레한 빚 걱정에 시달리는 것을 알면서도 딸이 왜 귀걸이와 드레스를 전당포에 맡기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는 시험을 열다섯 번 더 봐서 성격 단련이나 하라고 모욕을 주고, 남 이야기를 일삼는 지인들에게는 공기가 더러워지고 있으니 독가스를 그만 뿜으라고 흥분하는 등 모든 사람의 행동에 흠을 잡으며 깎아내린다. 그러나 밤에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옹졸함에 수치스러워하며, 영혼에 무언가 견딜 수 없는 게 있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고도 가련하다.
삶이 겉보기와 다르게 얼마나 비루하거나 숭고한지 뒤집듯 보여주는 일이야 그리 어렵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비루함과 숭고함, 좀스러움과 고상함이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 보여주는 일은 쉽지 않다. 문학에서는 숭고한 사람이 숭고한 행동을 한다고 숭고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비루한 사람이 비루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루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체호프의 소설이 유형화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클래식의 품격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슈만이 일깨운 그리그의 독창성[클래식의 품격/나성인의 같이 들으실래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1/17/11129237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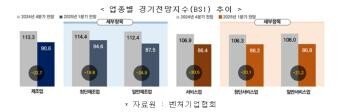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