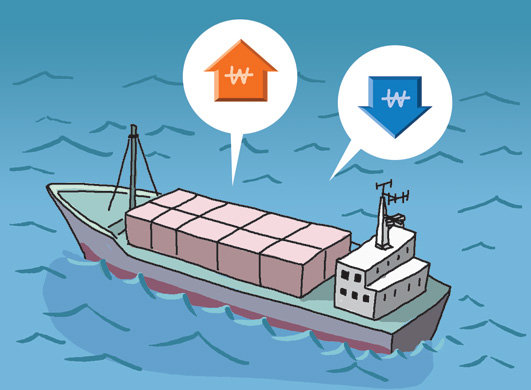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주인공 안토니오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무역선을 담보로 샤일록에게서 돈을 빌린다. 무역선이 태풍으로 침몰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자 그는 심장 근처의 살 1파운드를 내어 주어야 하는 운명에 놓인다. 결국 그 상선은 베니스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안토니오는 떼돈을 벌었을 것이다. 당시는 동양에서 유럽으로 싣고 온 향료 등 상품 자체가 부를 가져다주었고 담보로서의 가치도 있었다. 다만 선주이자 상인은 침몰의 큰 위험을 안아야 했다.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선주업이 정착되었다. 운송의 대가로 받는 운임으로는 떼돈을 벌지 못한다. 여전히 방법이 있다. 선가가 올랐을 때 배를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임대차액을 얻는 방법도 있다. 선주에게서 제1, 제2, 제3의 용선자로 선박이 빌려져서 용선료가 지급된다. 선주에게서 일당 1만 달러로 선박을 빌린 제1용선자는 제2용선자에게 2만 달러를 받는다. 제3용선자에게는 3만 달러를 받는다. 모두가 즐겁다. 그러나 경기가 폭락하여 운임이 5000달러가 되면 모두가 낭패를 본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발발해 운송 수요가 줄어들자 운임이 폭락하여 여러 해운회사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12년이 지난 2020년 가을부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정기선사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다.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 경비를 제하고 영업이익으로 5000만 원이 남는다.
대형 외국 정기선사들은 10조,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운임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적고 수요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서부 항구에서 동부로 이동되어야 하는 컨테이너 박스는 미국 서부에 쌓이게 됐다. 이를 이동할 트럭 운전사의 태부족 사태가 났기 때문이다. 공급이 절대 부족하니 화주들이 경쟁적으로 선박을 구하려고 한다. 운임이 폭등하게 된다. 코로나19로 풀린 돈 때문에 미국인들이 수입품을 많이 구입하기 시작하니 수요가 늘어나기까지 했다.
김인현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BreakFirst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컨테이너와 운송주권[김인현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58〉](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2/10/111699284.6.jpg)
![[김순덕의 도발]극단적 리더는 왜 실패하는가 ; 다시 보는 윤석열과 ‘처칠 팩터’](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88428.1.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