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남쪽과 북쪽으로 봄 강물이 넘치고, 보이는 것이라곤 날마다 오는 갈매기 떼.
꽃길은 손님 없어 비질한 적 없고, 사립문은 오늘에야 그댈 위해 열었지요.
소반 음식, 시장 멀어 맛난 게 없고 항아리 술, 가난하여 해묵은 탁주뿐이라오,
(舍南舍北皆春水, 但見群鷗日日來. 花徑不曾緣客掃, 蓬門今始爲君開. 盤v市遠無兼味, 樽酒家貧只舊배. 肯與(린,인)翁相對飮, 隔籬呼取盡餘杯.) ―‘손님의 방문(객지·客至)’ 두보(杜甫·712∼770)
적적한 시간을 찾아준 손님을 맞으면서 시인의 손길이 분주하다. 손대지 않던 꽃길도 쓸어보고 모처럼 빗장 걸린 사립문도 활짝 열어젖힌다. 그새 손님 방문은커녕 자신도 바깥나들이를 않았나 보다. 변변찮은 안주와 해묵은 탁주를 내놓으며 넌지시 건네는 품 넓은 한 마디, 합석해도 좋다면 울 너머 이웃 노인을 부를까 하는데 어떠하신지. 시인은 찾아온 손님이 최씨 성을 가진 현령(縣令)이라고 주를 달았는데, 손님도 이웃 노인도 격의 없는 시인의 푸근한 마음새에 흔연히 맞장구치지 않았을까.
거푸 과거시험에 실패하고, 자천타천으로 간신히 얻은 관직마저 오래 버티지 못한 채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두보. 가족과 함께 정착지를 찾아다니던 그는 쓰촨(四川)성에 초당(草堂)을 마련하면서 잠시나마 긴 유랑을 멈춘다. 지인의 도움으로 그는 쉰 살에야 이곳에서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소박한 호사를 누렸다. 직전까지만 해도 ‘추운 날 저물도록 산골짜기 원숭이 따라 도토리 주워’ 연명하던 그였으니, ‘보이는 것이라곤 날마다 오는 갈매기 떼’뿐인 무료함조차 행복한 일과였을 것 같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운명을 바꾼 시[이준식의 한시 한 수]〈155〉](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4/08/112749115.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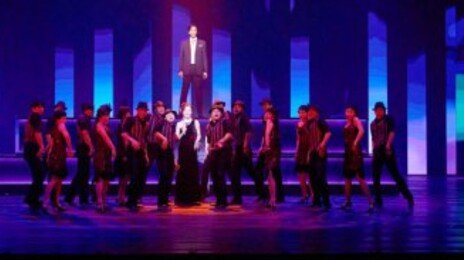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