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욕설 폭력… ‘선 넘은’ 러 혐오
침략자와 그 나라 문화는 구분해야

뉴욕 브루클린 남부에 ‘리틀 오데사’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다. 20세기 초부터 구소련과 동유럽계 이민자들이 자리 잡은 곳으로 우크라이나 항구도시 이름을 딴 별칭이다. 이 동네 식료품점 ‘테이스트 오브 러시아’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바실리 대성당을 묘사한 간판이 유명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명물이 사라지고 ‘인터내셔널 푸드’라는 다소 밋밋한 상호가 대신 내걸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일부 시민들이 “가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위협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업주는 “푸틴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오해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붉은 차양과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인 맨해튼 레스토랑 ‘러시안 티 룸’. 약 100년 전 러시아 제국의 발레단원이 차렸지만 이후 여러 손바뀜을 거쳐 지금은 미국의 한 금융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크렘린궁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름에 ‘러시아’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뉴요커들에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손님이 줄어든 것 정도는 다행인 축에 속한다. 우크라이나계가 운영하는 한 러시아 식당은 요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 러시아”라는 식의 욕설,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 ‘별점 테러’를 받거나 가게 유리창이 깨지는 공격을 당하는 곳도 있다.
문화계에서도 ‘루소포비아’(러시아 혐오)가 퍼지고 있다. 지난달 뉴욕 카네기홀에서는 발레리 게르기예프 등 친(親)푸틴 음악가들을 대신해 유럽에 있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급히 날아와 공연했다. 푸틴의 열렬한 지지자로 사실상 그와 ‘운명 공동체’인 이들을 무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였다. 그런데 ‘선을 넘는’ 일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의 오케스트라는 차이콥스키의 곡을 연주하지 않기로 했고 유럽 최대 음악 축제는 러시아인의 참가를 막았다. 이탈리아의 한 대학도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대한 수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전쟁 반대를 이유로 러시아의 모든 것을 싸잡아 배척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평소 푸틴과 별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 역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아무리 평화를 향한 신념이 있어도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려면, 이들에겐 조국과 가족을 버릴 각오가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지만, 자기 의사에 반해 전장에 투입되고 증오의 표적이 된 러시아 군인, 국민들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전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고 권력층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을 희생시키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이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무엇이 진정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특파원 칼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벗드갈 한국 블로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제2의 셰우첸코’ 없길 바란다는 우크라이나인들[특파원칼럼/김윤종]](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4/11/11278997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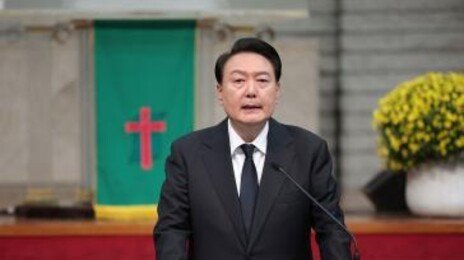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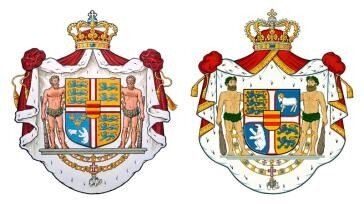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