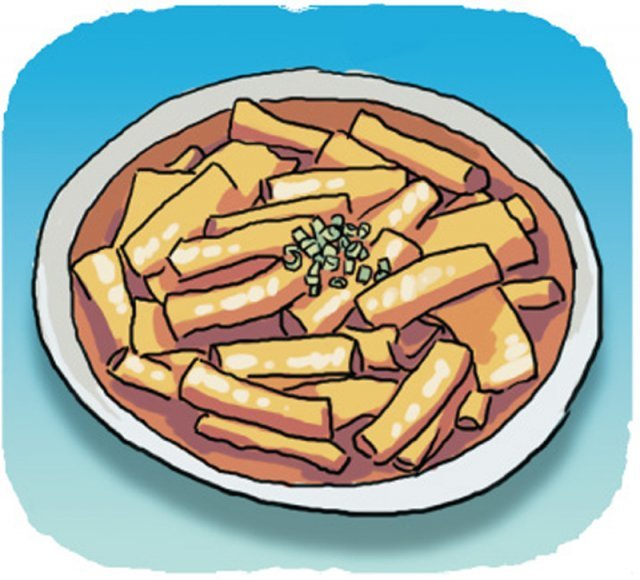

나흘을 함께 보낸 뒤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니, 같이 있다가 어떻게 혼자만 들어와?” 많은 이들이 싸운 거냐며 우려를 내비쳤지만 나는 되레 의아했다. “기껏 비싼 돈 들여 왔는데 그 사람도 충분히 즐겨야지!” 그가 없던 시간, 나는 홀로 요가를 다니며 즐거웠다. 내가 없을 시간, 그 또한 홀로 서핑을 배우며 즐거울 것이었다. 공항 앞에서의 작별이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의 예정된 행복을 포기시킬 만큼은 아니었다.
어느덧 연애 12년 차, 결혼 7년 차에 접어들었다. 제 입으로 평가하기 무엇하지만 나름대로 건강한 관계를 다져 오고 있다고 자부한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전히 서로 맞춰 나갈 지점들이 존재하지만 이 관계가 서로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모순적이게도 이렇게 서로에 대한 독립성이 자리하고 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의지하되 의존하지 않는 관계. ‘함께’를 핑계로 상대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않는 관계. 말하자면 ‘따로 또 같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내가 요가를 좋아하듯 그가 서핑을 좋아함을 존중하는 것. 매 주말을 기다려 데이트하지만 하루는 되도록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 나아가 불필요한 ‘반쪽 소환’으로부터 상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각자부터가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어느 한쪽에게 너무 많거나 적은 역할을 주지 않는다.
물론 가족의 형태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균형 값은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정답은 없다. 어떤 불균형은 누군가에겐 균형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균형이 어디쯤인지를 아는 것이다. 배려의 시소가 버겁게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쉽게는 나를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떡볶이를 함께 먹는 그에게 잊지 않고 고맙다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 마음들이 쌓여서일까. 이제 그는 나보다도 더 떡볶이를 좋아한다.
2030세상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공유 오피스와 낡은 사무실[2030세상/박찬용]](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4/19/11295449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