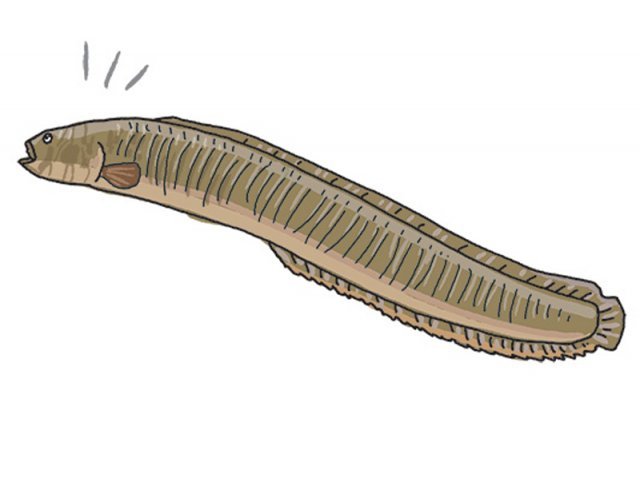

10년 전, 남해군의 해양문화를 조사할 때 이상한 형태의 낚싯대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호기심에 유심히 관찰했더니 돌 틈에 낚싯바늘을 가라앉혀서 베도라치만 낚고 있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낚시꾼에게 다가갔다. 아무도 먹지 않는 베도라치를 낚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었더니, 횟집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단다. 베도라치 전용 낚싯대를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베도라치 회를 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자 손질하기 까다롭지만, 맛을 본 사람은 다시 찾는단다.
그해에 분교를 함께 다녔던 동창들과 삼천포의 횟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 한데 어릴 때부터 낚시광이었던 친구가 베도라치 회를 주문하는 게 아닌가. 모두 미심쩍어했으나, 회 맛을 본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버리던 물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낙동강 하구의 명지, 다대포, 가덕도 등지가 주산지인데 보리가 익는 시기에 많이 잡혀서 ‘보리누름에 고랑치’라는 말이 있다. 이곳 어민들은 매년 4월에서 7월까지는 고랑치 어획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과거에는 시장성이 없어서 버리거나 사료용으로 싼값에 판매했다고 한다. 가격 형성이 되지 않아서 위판장에서 취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선원들이 미역국에 넣어서 먹는 정도였다. 가덕도의 어민과 횟집 주인장에 의하면 2005년 무렵부터 횟감으로 이용되면서 상업성 있는 물고기가 됐단다. 요즘은 kg당 위판 가격이 1만 원을 훌쩍 넘었고, 소비자 가격은 2만5000원 내외로 형성될 정도로 비싼 물고기가 됐다. 대량으로 잡히는 어종이 아니므로 산지에서 대부분 소비돼 내륙에서 보기 어렵다.
광어, 우럭 등 흰 살 횟감을 즐겼으나 요즘은 방어, 고등어 등 붉은 살 생선회 선호도가 높아졌듯이, 한때 고급 생선이 양식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가 하면, 버리던 물고기가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동아리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어부와 소비자의 직거래[김창일의 갯마을 탐구]〈80〉](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6/30/11421306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