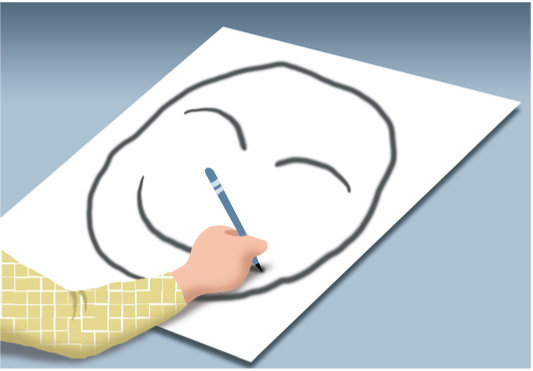

다들 어떻게 웃고 사는지.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일상이지만 웃는 얼굴이 궁금하다. 웃음 참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아이들은 웃음소리부터 새어 나와 웃고 있구나 알아챈다. 하지만 어른들은 좀처럼 소리 내어 웃질 않고, 매일매일이 바쁘고 빠르고 가빠서 웃는 얼굴을 상상해보기 어렵다. 그러다 깨달았다. 나조차도 웃고 있지 않다는 걸.
요즈음 내 얼굴은 딱딱한 무언갈 악물고 있는 사람 같다. 버거운 일들 꾸역꾸역 해내다가 몸과 마음이 소진돼 버렸다. 기분은 가라앉고 산책할 시간은 줄고 스마트폰만 확인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렸다. 창밖 볼 여유도 없이 일과 시간에 쫓기듯 지내던 얼마간 나의 얼굴은, 태연하게 잘 숨겨두었지만 실은 몹시도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이었다. 더 해보고 싶은 욕심과 잘 해내고 싶은 강박은 웃음부터 훔쳐 가 버렸다.
다시 동그랗게 웃어보고 싶다. 경직된 얼굴을 웃게 만들려면 볼을 꼬집어 조물조물 만져주고, 눈꼬리도 입꼬리도 간지럽혀 빙그레 올리고, 입에 꽉 물고 있는 딱딱한 걱정일랑 퉤 뱉어 버려야 할 것이다. 웃는 얼굴 그리기. 웃을 일 없다 하더라도 웃는 얼굴 그려보기. 어쩐지 비장한 각오로 동그라미 그리다가 피식 웃어 버렸다. 동그라미가 못생겼다. 당연하게도 사람의 손으로 그린 동그라미는 완벽하지 않았다.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이상하게 좋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게 웃을 것이다. 꼭 내 동그라미 같은 얼굴로 하루를 살고 싶다. 다 그린 웃는 얼굴 아래에는 내 이름을 써두었다.
-
- 좋아요
- 12개
-
- 슬퍼요
- 3개
-
- 화나요
- 1개
![미켈롭 가이[삶의 재발견/김범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6/23/114076361.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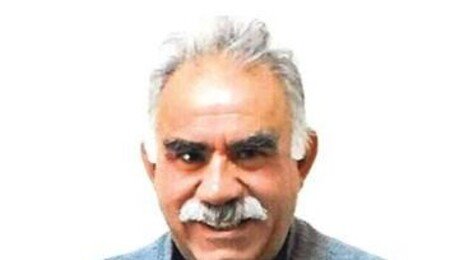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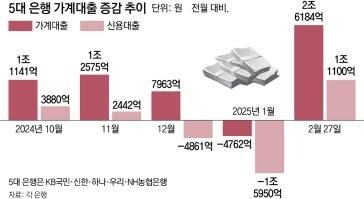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