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적 특성상 임종 한 달 전의 병실 모습과 장례식장 모습을 동시에 볼 기회가 있다. 장례식장에도 빨리 오고 오래 머물다 가지만 정작 고인이 살아 있을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무척 아쉬워하고 슬퍼한다. 고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고인과 본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었는지 말하며, 장례식장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한다.
반면 임종 전에 병문안도 자주 오고, 환자의 가족과 교대로 병간호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처럼 환자의 투병 생활을 돕는다. 이런 분들은 장례식장에서 별말 없이 조용히 있다. 자신이 고인과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 고인의 임종 전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병간호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문상객이 오면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짐작하기로 이들 역시 무척 슬프지만 고인에게 여한 없이 했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요즘은 집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둔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병원에서 거동이 어려워지면 누군가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상대방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하기도 미안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연락 한번 못 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눈을 감는다. 이런 때 그 사람이 와준다면, 전화라도 한 통 해준다면 무척 고마운 일이다.
마지막 순간은 시간 맞춰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임종을 전해 듣고 나서야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 ‘좋은 분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한다. 상대가 당연히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해 만남을 훗날로 미룬다.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데도. 그러니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죽음을 아쉬워하기보다 그가 살아 있을 때 잘해주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
- 좋아요
- 31개
-
- 슬퍼요
- 2개
-
- 화나요
- 2개
![육식의 재발견[삶의 재발견/김범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8/04/114808813.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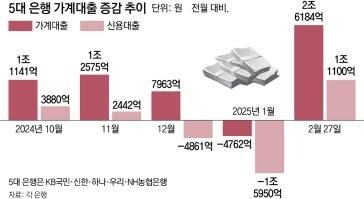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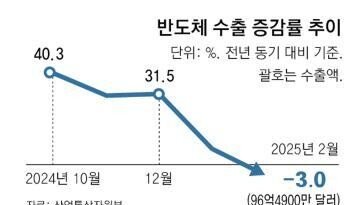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