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수평선을 보다
한반도 삼면이 바다라고는 하지만, 바다를 보려면 큰마음 먹고 먼 길을 떠나야 한다.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 호젓한 바닷가에 도착해야 한다. 힘들여 도착하여 마침내 텅 빈 바다, 텅 빈 하늘, 그리고 하늘과 바다가 만나 만드는 간명한 수평선을 본다. 이 단순한 풍경을 오래도록 보는 것도 아니다. 잠시나마 그 무심한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해서 기꺼이 먼 거리를 달려서 온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기도 한 풍경. 그 풍경을 보면서, 나는 잠시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물성이 없거나 희박해서 그리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람이다. 아무 색깔도 형체도 없는 바람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나? 바람의 효과를 그리면 된다. 바람으로 인해 흩날리는 물체를 그리면 되는 것이다. 스위스 출신으로 파리에서 활약한 화가 펠릭스 발로통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라. 일제히 옆으로 쏠린 나무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왜 그림의 제목이 ‘바람’인지를 납득한다. 그들은 바람을 보지는 못했을지언정, 바람의 효과는 본 것이다.
미국 화가 에드먼드 타벨이 1898년에 그린 ‘파란 베일(The Blue Veil)’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다. 제목이 시사하듯, 그림의 주인공은 옆모습을 한 여성이라기보다는 그 여성이 두르고 있는 파란 베일이다. 베일의 일렁임은 바로 그 순간 바람이 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작고한 문학 평론가 김현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빗질 자국이 남아 있는 마당이 빗질 자국조차 없는 마당보다 깨끗해 보인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보다 빗질 자국을 남기는 것이 더 깨끗해 보인다니, 그게 정말일까. 일본 교토에 있는 료안지(龍安寺)의 가레산스이(枯山水·마른 정원)를 본 사람은 김현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선(禪)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메마른 인공 정원. 그 모래와 돌 위에는 정원을 가다듬을 때 지나갔던 써레질 자국이 남아 있다. 아무 자국이 없는 것보다는 그 쓸린 자국이 료안지의 마른 정원을 선적(禪的)으로 만든다. 불필요한 잡것을 비워내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이 료안지를 한층 더 선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인간을 혐오한 나머지,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는 정글을 마냥 그린다고 해서 인간의 부재가 잘 묘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문명의 흔적을 그리되 인간은 그리지 않을 때, 인간의 부재가 한층 더 도드라진다. 거대한 건물의 잔해 그림이 전하는 기묘한 감동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효과적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정말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 상태는 고요하기보다는 고요함이 시끄럽게 설치고 있는 상태처럼 느껴진다. 차라리 백색 소음이 있는 것이 어떨까. 아무 소리도 없는 것보다는 백색 소음이 있어야 마음이 더 안정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백색 소음이 있어야 집중이 더 잘되고, 잠도 더 잘 온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수평선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굳이 강변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기에 원한다면 당신이 무엇인가 담을 수도 있다. 인생에 정해진 의미가 없기에, 각자 원하는 의미를 인생에 담을 수 있듯이. 그래서였을까.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나 안겔루스 질레지우스 같은 신비주의자들은 하느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부재 혹은 없음 속에서 인식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지전능의 하느님을 ‘없음’이라고 불렀다.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어떤 한계와 장애를 의미하므로.
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썩은 육신에서 삶의 진실을 마주하다[김영민의 본다는 것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8/15/11495615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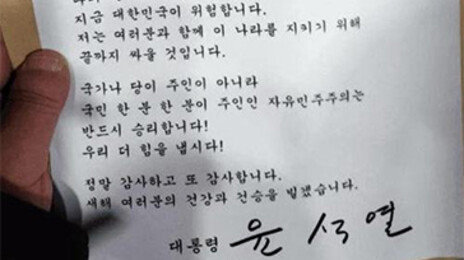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