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권 후에도 검찰총장 데자뷔 어른거려
자기 생각보다 민심부터 살피는 모습 보여야

3·9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로는 ‘정권 교체’(39%)가 가장 많았다(갤럽 조사). 다음으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 또는 그보다 나아서’(17%)였고, 신뢰감(15%)과 공정·정의(13%) 순이었다. 정권 심판 여론은 대선 기간 내내 50%를 웃돌았다.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대결 구도가 승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던 셈이다. 대선 기간 중 적잖은 실언 등으로 곤두박질쳤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구도 덕분이었을 것이다.
대선 승리 후 이런 구도는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 맞선 강단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은 과거의 시간이다. 오롯이 ‘대통령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검찰총장 데자뷔가 어른거리는 듯하다. 대통령 정치가 보이지 않아서다.
대통령 정치의 핵심은 인사다. 공직사회 인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그 인사를 통해 정권의 색깔, 메시지를 발신한다. 관건은 해당 분야의 일류 전문가를 제대로 발탁했는지, 능력과 업무 역량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했는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인사’ 성적표는 최하위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선 당대 최고의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까지 삼고초려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비판과 견제가 없는 순혈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한 검찰 총수 시절은 잊어야 한다.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은 윤 대통령이 “신속히 하라”고 힘을 실었다. 뒤늦게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불과 4일 만에 “공론화를 추진하라”며 물러섰다. 교육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이슈인데도 손바닥 뒤집듯이 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지도자로서 국정 전반을 아울러야 한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장관제는 부처 장관이 내놓은 정책에 무조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다. 사전에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정무적 업무다. 법리 검토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과거의 관성이 아니었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기자단 빠진 尹 현장행보, 국민들 궁금증 더 키운다[기자의 눈/이상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9/06/126893319.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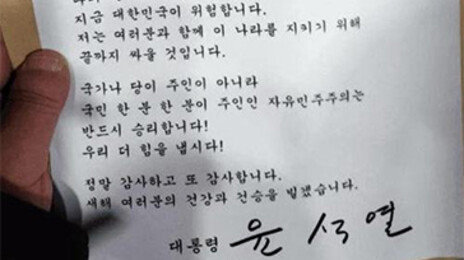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