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모수개혁” 정부 로드맵 나와
여론 설득하며 가겠다는 결기 안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던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에 먼저 시동이 걸렸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떠넘겨진 과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라며 그 개혁 방향을 언급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재정추계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한 개혁안이 내년 10월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개혁이 마무리된다.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내년 안에 완수하는 것,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과 시간표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개혁 당사자이자 대상자이다. 그만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최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87%)는 데 공감하지만 ‘보험료가 부담 된다’는 응답(66%) 역시 많았다. 연금개혁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내 연금은 빼고 개혁하라는 저항이 거셀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로드맵만 보면 그 어려운 연금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와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안 수석은 노후에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세대 간 공정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청년 1명이 노인 5명을 부양해야 할지도 모르는 고령사회가 임박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을 양립시킬 묘수는 없다. 그것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말이다. 기초·퇴직·주택 연금과의 다층 구조 설계나 직역연금과의 통합 같은 구조개혁이라면 모를까, 모수개혁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다.
지난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4개를 발표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이를 황급히 거둬들였다. 당시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고 연금개혁은 아예 실종됐다.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살살 개혁할 테니 따라와 달라는 식이나 몇 년 후 기금 소진 같은 숫자로 공포를 부추기는 식으로는 동력을 얻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산업화로 날로 성장하던 시대에 설계됐다. 기술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합계출산율 0.8명이라는 인구절벽이 닥친 축소사회에는 맞지 않는다. 다음 세대에 홀로 다섯 노인을 부양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데 투자하라고 할 것인가. 평생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린 공무원의 노후를 민간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공공과 민간의 연금 벽을 허물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알쏭달쏭한 수사(修辭)를 목표로 제시하는 대신에 당장 욕을 먹더라도 왜 개혁이 필요하고, 왜 고통을 나눠야 하는지 정부가 이야기해야 한다. 모두를 기쁘게 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기자단 빠진 尹 현장행보, 국민들 궁금증 더 키운다[기자의 눈/이상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9/06/126893319.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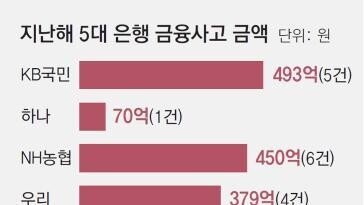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