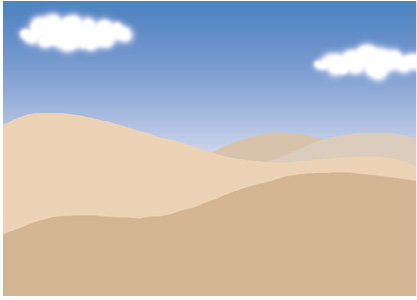

―테오도로 모노 ‘사막의 순례자다’ 중
사막을 연구한 프랑스 과학자인 모노는 연구자의 시선으로 사막 사회의 계급성을 탐구하면서도 유목민의 자유로운 삶을 존중한다. 사막을 성소 삼아서 고독하고 단순하지만 평화롭고 의연한 영적인 삶을 실천했다. 사막은 도피처가 아니었다. 사막의 삶을 발판 삼아 그는 폭주하는 세상의 폭력과 차별에 저항하는 지적 시위를 평생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 감염의 시대가 시작되고 일상의 자유마저 제한될 때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의연하게 살면서 삶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자문했다. 나는 불필요한 권력을 넘보지 않고 내면과 일상적인 의례에 힘을 싣고자 애썼다. 모노가 사막에서 그랬던 것처럼 치열하고도 들떠 있어야 할 것 같은 삶 한복판에서 우리는 ‘생략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기득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어렵다. 타인의 시선이나 체면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그래서 학자 모노와 같은 실천적인 삶의 궤적이 내게 커다란 용기와 혜안을 준다. 나도 차분하고도 소박하게 내 사막의 자원을 귀하게 아껴 쓰고자 한다. 소유보다는 존재, 소비보다는 경험,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연습할 것이다. 담백하고 자립하는 삶을 살면서 고요한 중심을 지킬 것. 그런 중에 의연하게 국경을 넘고 분과 학문도 넘고 기득 권력의 시선도 넘을 것.
내가 만난 명문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

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연인과 함께 ‘길티 플레저’[내가 만난 名문장/한귀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9/18/115503929.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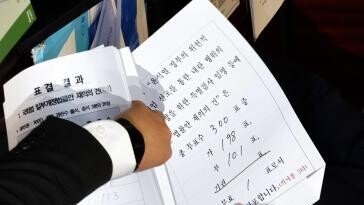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