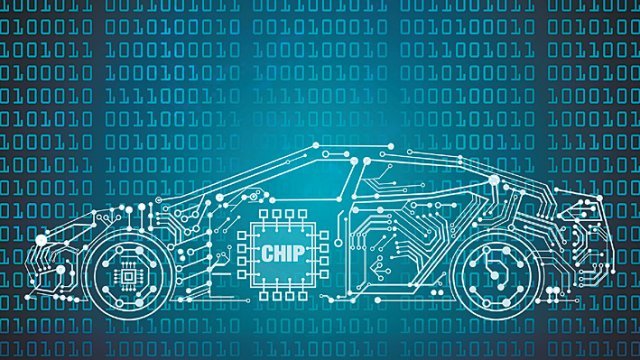

전문가들은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보다 테슬라의 차량 소프트웨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이른바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정점에 테슬라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운전자에게 기존의 차와는 상당히 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테슬라의 디스플레이는 옆 차선을 지나가는 차가 세단인지, 트럭인지, 버스인지를 실물과 거의 비슷한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앞차에 가깝게 다가가면 거리가 몇 cm 남았는지까지 알려준다.
차량 소프트웨어는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차량 성능 전반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전자 장치가 늘어나고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복잡한 기능을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화가 필수적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차의 개별 기능을 통제하던 전자제어유닛(ECU)의 숫자를 줄여 소수의 ECU가 여러 기능을 통합·제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효율적인 운영체제(OS)가 제품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대가 자동차 업계에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테슬라는 기존의 자동차 위에 컴퓨터를 얹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바퀴를 다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계공학이 아니라 전기·전자·컴퓨터공학을 중심으로 차를 새로 정의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얘기다.
이런 테슬라를 쫓아가야 하는 기존 완성차 기업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기계공학 전문가 중심의 거대 연구개발 조직 안에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을 새로 꽃피우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만들기로 하면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을 인수한 것은 이런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체질이 다른 외부 조직을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에 두고 우수 인력을 영입하며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독일 폭스바겐 역시 차량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다가오는 ‘맞춤형 자동차’ 시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9/29/115719580.7.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