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걱정도 잠깐. 빠끔히 열린 진료실 문 밖으로 외국인 스님과 간호사의 모습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이 둘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것도 중간중간 웃고 맞장구를 치면서 다정하게…. 그 모습이 의아해서 나중에 물어보니, 손짓발짓으로 눈치껏 다 설명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파란 눈의 스님과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한국인 간호사가 서로 원활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소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나 역시 영어 울렁증이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나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했다. 겸연쩍어서 농담하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내 영어가 괜찮다고 했다. 내가 영어를 잘했던가 되짚어봐도 내 영어 실력이 별로임은 이미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아 유 키딩?
반면 한국인들과의 대화가 문제였다. 한국말에 능통하니 대충 흘려듣는 경우가 많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내가 상대방 말을 잘 안 들었고, 상대방 역시 내 말을 잘 안 들었다. 서로 경청하거나 존중하는 자세가 안 나오는데 소통이 될 리 없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상대방도 나를 보며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의 언어를 몰라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한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를 잘하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소통시키는 것일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간병인에 대한 예의[삶의 재발견/김범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10/27/116184389.8.jpg)



![[사설]당혹과 충격, 혼란과 슬픔 속에 2024년은 저물지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59128.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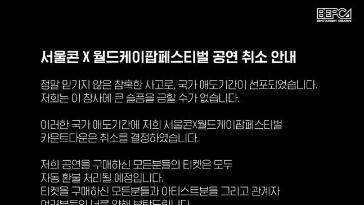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