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앞에 멈춰선 나는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무섭고 두려운 것 말고도, 너무 아름다운 걸 마주쳤을 때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 서둘러 출근하던 젊은 나. 그때 나는 뭐가 그리 바빠서 초조했는지, 뭐가 그리 부루퉁해서 찌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문득 미간과 어금니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닫고 휘파람 같은 숨을 내쉬었다. “안녕.” 어색하지만 애써 웃어보이자 아이가 더 활짝 웃어주었다.
다시 걸음을 옮기는 출근길, 늘 같았던 풍경이 한소끔 달라졌다. 가만히 둘러보니 가을이었다. 볕에 잘 마른 부드러운 천 같은 바람이 뒷머리를 쓸어주었다. 환한 웃음을 마주했을 뿐이었는데 처음 느끼는 뭉클함이 스몄다. 아까의 순간을 허밍하듯 곱씹어 보았다. 코끝 찡해지는 이런 느낌이야말로 가을이라고 잘 기억해 둬야지. 나는 소리 내 ‘가을’ 하고 말해 보았다.
하늘도 낙엽도 바라볼 새 없이 가쁘게 살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어주면 좋겠다. 웃음이 영 어색하다면 이렇게 따라 해보면 된다. 소리 내 ‘마음’을 말해보기를. 웃음 머금은 얼굴이 된다. 소리 내 ‘가을’을 말해보기를. 웃음 짓는 얼굴이 된다. ‘마음’과 ‘가을’을 말해보며 웃어준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주 웃어줄 것이다. 마음, 허밍 같은 무언가 내 안으로 스민다. 가을, 바람 같은 무언가 바깥으로 퍼진다. 가을바람 코끝에 스치면 안팎으로 따뜻해질 준비를 하자고. 날마다 추워질 테지만 우리는 너그러워지자고. 마주 웃는 얼굴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랑을 미루지 말자[관계의 재발견/고수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11/03/116299368.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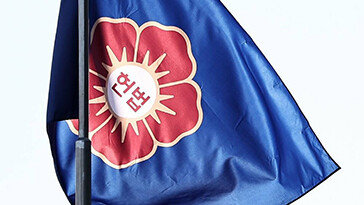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