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특징 중 하나는 습관적인 ‘위원회 만들기’다. 일만 생기면 우선 위원회부터 만든다. 혁신위원회, 대책위원회 같은 당내 위원회도 모자라 국회에도 위원회를 꾸리려 든다. 국가의 모든 일을 소관으로 하는 17개의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있지만 굳이 또 만든다.
7월에도 그랬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을 다룬다며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여야는 민생경제특위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부동산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13명의 의원도 특위에 배치됐다. 이들은 7월 26일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운 만큼 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하자”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자”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특위에서 다루겠다던 현안 중 처리된 건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두 가지뿐이다. 여야는 “다른 현안들은 이견이 컸다”고 핑계를 댔다. 여야의 이견은 늘 있는 일이고, 그 간극을 좁히라고 열리는 게 회의다.
하지만 민생경제특위 회의는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조차 “(특위 활동 기간이)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특위는 7월에 2번, 8월에 1번, 9월에 2번 열리는 데 그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애초에 민생경제특위가 여야의 ‘보여주기식’ 합의였기 때문이다. 7월, 여야는 원(院) 구성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국회 개점휴업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일 안 하는 국회”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민생’이라는 이름을 붙인 위원회를 만들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것.
민생경제특위가 끝났지만 국회에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각각 국민연금, 선거제도, 사법 시스템 등 민생경제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다. 이 위원회들의 결말은 민생경제특위와 다를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구독
-

DBR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김지현]기업 사활 걸린 상법 개정인데… ‘표’만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野](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3/16/13121825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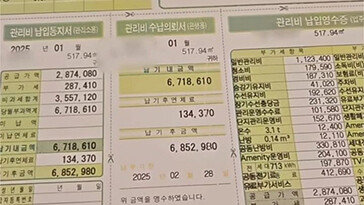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