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예방과 사후 대응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일으킨 중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이 없을 경우 경찰이 중앙 통제된 방법으로 군중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재난안전법에 ‘주최자가 있는 참여자 1000명 이상의 지역 축제’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명시돼 있다고 해서, 그 밖의 다른 행사는 국가의 보호 의무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주최 측이 뚜렷하지 않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고 위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기는 것이 상식 아닌가. 더구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재난안전법과 경찰관직무법에는 응급 상황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 중 특히 토요일 오후 10시경 시민들의 이태원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인력을 늘리지 않았다. 참사 사흘 전 이태원 상인들이 용산구 및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압사사고 우려를 제기했어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대형 사고의 위험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자국민이 압사 위험에 처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법과 제도를 이유로 팔짱을 끼고 있다는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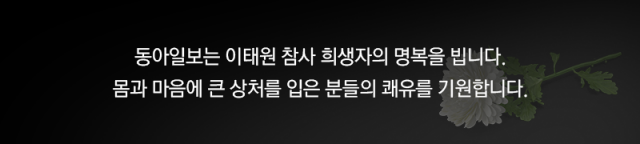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어린이 책
구독
-

교양의 재발견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03/130787250.1.jpg)

![이대론 공멸…중국 자동차 시장 ‘악’ 소리 나는 이유[딥다이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87199.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