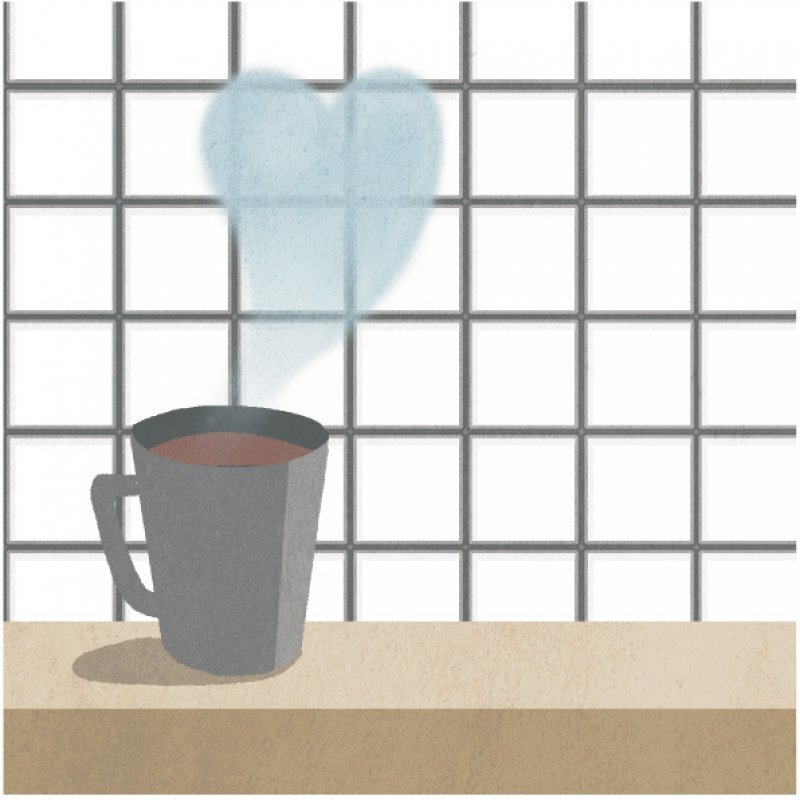

“상품화가 어려워서 그런 건 몇 년 전에 다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100각 타일은 찾기부터 쉽지 않았다. 시중의 100각 타일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단가가 저렴한 만큼 광택감이 얕고 색채가 흐릿하다. 그보다 비싼 유럽산 100각 타일은 남유럽풍으로 색감과 광택과 무늬가 요란하고 가장자리가 구불구불하다. 찾다 보니 20여 년 전에 수입되어 악성 재고로 남은 이탈리아산 무광 100각 타일이 내 기호에 맞을 것 같았다. 인터넷과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 근처를 돌고 돌아 겨우 찾았다. 악성 재고라 가격도 쌌다.
“어떡하죠, 고객님?” 사정이 생겨 공사를 멈췄다 재개한 후 연락하니 창고 정리 중 타일을 폐기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뒤질 수밖에 없었다. 같은 브랜드 타일을 파는 곳이 인터넷에 딱 하나 있었다. 저 멀리 광주(光州)였고 사려던 색깔과 달랐으나 가릴 형편도 아니었다. 사장님은 필요 수량을 묻더니 “그 정도는 있어요잉”이라고만 답했다. 그 말씀만 믿고 카드를 긁었다. 다행히 주문한 그대로의 물건이 화물 택배로 왔다.
개념적으로 보면 100각 타일이 붙은 표면은 돈 이야기를 넘어선다. 100각 타일이 주는 아름다움의 핵심은 기획과 약속의 이행이다. 수많은 타일이 평평하게 붙으려면 밑면이 평평해야 하니 벽 표면 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실은 벽 공사 이전 설계부터 기획되어야 한다. 타일이 흠 없이 붙으려면 타일을 잘라 붙일 만큼 좁은 면이 없어야(현장 용어로 ‘쪽’이 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벽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치수를 잡아야 만들 수 있다. 설계 단계부터 기획이 되고, 설계 도면이라는 약속이 시공으로 지켜져야 하니, 100각 타일이 나란히 붙은 벽은 수준 높은 건축술의 상징이다.
“줄눈이 딱딱 떨어지게 작은 타일을 붙였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걸 지금의 한국에서 바랄 수는 없습니다. 공임 없이는 장인정신도 없어요.” 고민을 털어놓자 가까운 건축가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지금은 100각 타일 대신 600×300의 대형 타일을 주로 붙인다. 면 상태가 나빠도 몇 장 붙이면 공사가 되니 타일공의 작업 시간도 줄어든다. 겉만 그럴싸하게 마무리하고, 타일 한 겹만 떼면 대충 만든 표면이 드러나는 곳이 한국 사회라면 지나친 과장일까. 정교한 100각 타일 시공을 최근 한국에서 본 기억이 없긴 하다.
2030세상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BreakFirst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독서 인구는 주는데, 신간은 느는 사회[2030세상/김소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12/06/116862461.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