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에서 찾아간 곳은 회룡포마을이 유일했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과 금천이 흘러들어 농경지가 비옥한 땅. 가을 햇살을 받아 잔물결이 반짝였고 주변으로는 갈대가 흐드러지게 엉켜 있었다. 날 선 기운 없이 평화롭고 잔잔한 비무장지대가 떠오르는 풍경이었다. 냇가로 내려가려니 갈대숲에 있던 꿩 두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랐다. 황톳길에서는 아이랑 달리기도 했는데 제법 긴 시간 동안 그곳을 지나는 차는 한 대뿐이었다. 그곳이 더 좋았던 건 언 땅을 비집고 푸릇푸릇 들판 가득 얼굴을 내민 보리 새싹 덕분이었다. 보리는 파종 시기에 따라 봄보리와 가을보리로 나뉘는데 11월은 가을보리가 쑤욱 하고 땅 위로 올라오는 달이다. 분명 겨울이면서도 생명력으로 찬란한 봄이 한쪽 땅에 가득한 풍경은 아름답고도 신비로웠다. 차를 타고 달리는 길. 들판에는 볏짚을 동그랗게 말아 놓은 대형 ‘마시멜로’가 가득했다. “어디 찍고 가야 할 곳이 없으니까 오히려 좋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을 때도 좋겠어.” 예천 여행 이틀째에 아내가 한 말이다.
세련된 커피숍도, 우뚝한 명승지도 많지 않은 그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옵션 중 한 곳을 택하는 것도 자유지만 복잡한 선택지 없이 명료한 단순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또 다른 자유의 감각임을 알게 됐다. ‘심심한’ 땅이야말로 귀한 땅이라는 것도. 그저 너른 들판은 왜 명소가 아닌가. 나의 생활은 계속 채워야 하는 일에 가깝다. 인스타그램도 채워야 하고 기획안과 제안서, 전시 일정도 채워야 한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그렇듯 늘 무언가를 채워야 하기 때문일 거다. 예천에서는 채우려고 애쓰지 않았다. 절로 그렇게 됐다. 어느 때는 ‘인풋’이 없어야 더 좋은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다시 한옥에 살 결심[공간의 재발견/정성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12/22/117111701.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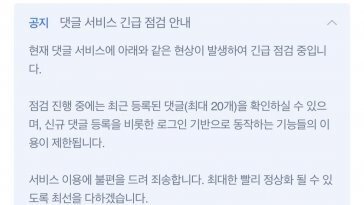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