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에서 살다 근처 한옥으로 이사 온 지 20여 일이 지났다. 서울 서촌에 있는 작은 생활형 한옥이다. 북촌의 번듯한 한옥이라면 이런저런 일도 덜 생기겠지만 이곳에서는 수시로 집을 살피고 관리해줘야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의젓한 어른이었다가 겨울만 되면 어린아이나 노인이 되는 것 같달까? 챙기고 단속해야 할 일이 부쩍 많아진다. 이전 한옥에서는 혹한에 수도관이 얼어 위아래로 검은 옷을 입고 승합차에서 내린 특수기동대 같은 분들이 마당을 1박 2일간 뚫은 적도 있다. 또 다음 한옥에서는 얼음물이 떨어지면서 나무문이 얼어 드라이어로 문을 녹이고 바깥으로 나간 적도 있다. 누가 그런 집에 살라고 했냐고? 맞다. 사서 하는 고생이다.
그럼에도, 다시 한옥으로 올 결심을 한 건 중독 때문이다. 한옥중독.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겨울을 겪고 마침내 봄이 오면 긴 고행이 끝난 것처럼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 된다. 봄이다!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온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많아진다. 밥도 굳이 밖으로 나와서 먹는다. 친구들을 불러 삼겹살을 굽고 캠핑 의자 갖다 놓고 볕 속에서 존다. 돗자리 깔고 누워 느릿느릿 흘러가는 구름을 구경하다 보면 저 안에서부터 샘물이 차오르는 것 같다. 여름과 가을도 그렇게 별 탈 없이 흘러간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나무 기둥에 발을 올린 채로 책을 읽고, 커피를 타 마당에서 바람을 쐬는 시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들이다. 이 모든 것은 이를테면 직접 경험.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한강과 남산 전망도 부럽지 않은 것이 그건 눈으로만 만족해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한옥에서의 일상은 풍경과 계절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 찌릿찌릿 몸의 세포가 알알이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 기억 때문에 나는 다시 한옥으로 왔다. 모르겠다. 아직 고생을 덜해서인지 사건 사고를 포함한 온갖 희로애락이 내겐 살아있는 생활 감각이자 숨구멍 같다.
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홍은심 기자의 긴가민가 질환시그널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헬스캡슐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연말에는 친구네와 집을 바꿔[공간의 재발견/정성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1/12/117414723.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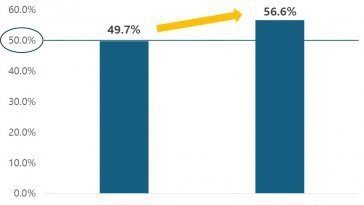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