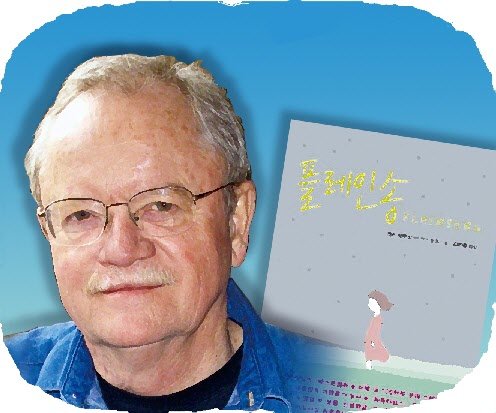
시작은 그리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다. 열일곱 살에 덜컥 임신한 여학생 얘기니까. 그렇게 만든 남자는 어딘가로 가고 없다.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 어머니는 꼴좋다며 딸을 쫓아낸다. 무책임한 아버지는 가출하고 없다. 학생은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혼자 사는 선생님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에 아름다움이 조금씩 붙기 시작한다.
그런데 선생님의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 노인은 재산을 훔치러 들어왔다며 아이를 구박하고 폭력으로 대한다. 고민을 거듭하던 선생님은 시골에 사는 두 노인한테 도움을 청한다. 농사를 짓고 소를 치는 노인 형제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순박한 농민을 닮은 그들은 엉겁결에 아이를 받아들인다. 오갈 데 없다는데 어쩌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어렸을 때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로 학교를 안 다니고 외톨이로 살아서 목장과 농장 일 말고는 아는 게 없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여자와 살아본 적도 없다. 무슨 얘기든 해서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한테 기껏 한다는 얘기가 곡물과 소에 관한 얘기다. 콩과 소의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어색한 순간들을 거치면서 그들의 집은 서서히 아이의 집이 되고, 그 아이가 그곳에서 학교를 마저 다니다가 낳은 아이의 집이 된다. 그들은 부모보다 더 부모가 되어 준다. 생물학적인 가족이 해체된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들어선다. 황야의 무법자처럼 살아온 두 노인에게도 변화가 생긴다. 소들을 돌보던 그들이 인간을 돌보면서 평생 자신들에게 붙어 있던 외로움을 떨쳐낸다. 그들에게 타자는 지옥이 아니라 구원이다.
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인터뷰
구독
-

황형준의 법정모독
구독
-

데스크가 만난 사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매미의 마지막처럼[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279〉](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1/24/117559164.9.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