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어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전국의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 체계를 확충하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힘들지만 보상은 적은 진료과목의 보상률을 높이며, 의료 인력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지원대책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소아과 대란’으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급성 심근경색 응급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병원 뺑뺑이’를 돌고, 전국 시군구의 40%는 분만 취약지역이며, 동네 소아과는 줄폐업하는 상황이다. 중증·응급 환자가 최종 치료까지 한 곳에서 받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별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며, 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할 경우 이 같은 의료 공백 사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이 빠져있어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우선 각급 병원의 의료수가를 대폭 줄여 필수의료에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대형 병원에만 재원이 몰리게 된다. 추가 재원 없이 소규모 병의원 수입을 줄여 대형병원에 몰아주기 식으로 간다면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저출산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되 5년 단위로 적정 의사 수를 재산정하는 방법도 있다. 전국 어디서나 제때 필수의료 혜택을 받게 하려면 제도 정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사설]트럼프發 ‘신3高’ 덮치는데…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가 더 불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13/130423494.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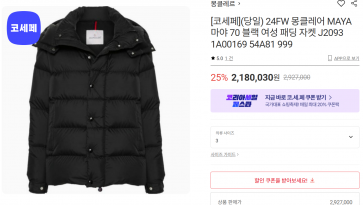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