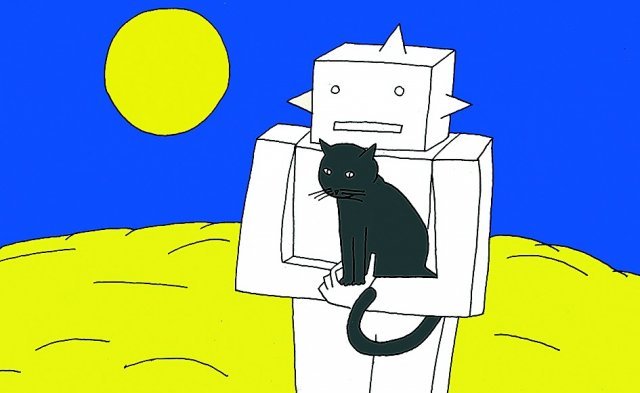

면담시간이 되자 학생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말 없이 지도교수란에 사인을 해주면 끝이었다. “물리가 어려웠니?” 학생을 보자 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열망은 있었는데 어렵기도 하고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싶어서 편입을 했어요.” 마치 잘못을 한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잘 생각했네”라는 말과 함께 내 생각을 이야기해줬다.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고통이다. 적성에 맞고 열망을 품고 있어도 일이 어려워지고 뒤틀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듯 힘들어진다. 나 역시 학생 때 ‘물리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어찌어찌 자학의 터널을 지나면 신기하게도 열심히 물리 문제를 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때는 대부도에서 포도밭을 가꿔 와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와인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냉철하고 치열한 경쟁의 세계를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가끔 와인 만드는 책을 찾아 읽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열리는 학회가 끝나면 와이너리를 진지하게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고비는 와인의 알코올처럼 사라졌다. 아마도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물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명 때문이 아니었을까?
인생은 선택이다. 50 대 50이라는 확률적 선택. 가느냐, 가지 않느냐. 양자역학도 마찬가지다. 양자의 미래를 확률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슈뢰딩거의 파동함수를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의 운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예측만 할 수 있을 뿐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뚜껑을 열어 보기 전에는.
거시 세계를 사는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을 한다. 가지 않은 길에 미련을 가진다. 우연히 일어난 일임에도 인과적으로 생각한다. 이유를 찾고 감정적으로 다가간다. 마치 미시 세계의 양자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현재를 살고 있다. 가지 않는 미래는 알 수 없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곡선이 필요한 세상[이기진 교수의 만만한 과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3/23/118488968.8.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