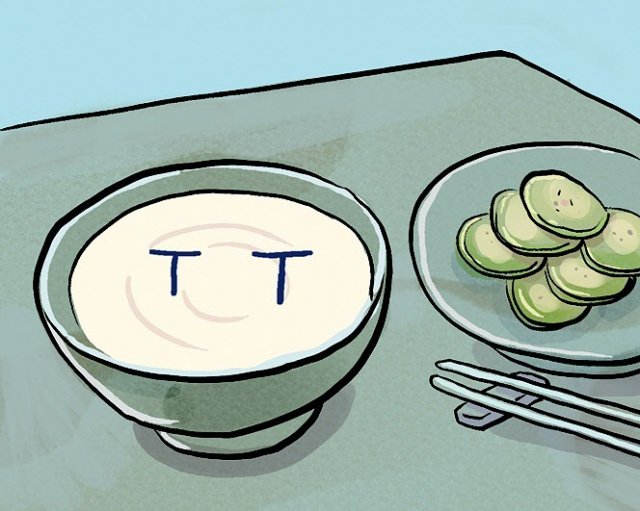
술잔 앞에 두고 돌아갈 날 알리려는데, 말도 꺼내기 전 고운 임이 목메어 울먹인다.
인생이 원래 정에 약해서 그렇지, 이 응어리가 바람이나 달과는 아무 상관없지.
이별가로 새 노래는 짓지 말게나. 옛 곡 하나로도 애간장이 다 녹아나거늘.
(尊前擬把歸期說, 未語春容先慘咽. 人生自是有情癡, 此恨不關風與月. 離歌且莫翻新闋, 一曲能教腸寸結. 直須看盡洛城花, 始共春風容易別.) ― ‘옥루춘(玉樓春)’ 구양수(歐陽脩·1007∼1072)
낙양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수도 개봉(開封)으로 귀환하는 시인을 위해 열린 전별연. 시인이 떠날 시기를 알리려고 할 즈음 갑자기 동석한 ‘고운 임’이 서럽게 울먹인다. 세파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두루 겪은 시인이 차분하게 상대를 다독인다. 이별의 아픔으로 응어리가 맺히는 건 인간이 천성적으로 다정다감해서라네. 무심한 저 청풍명월과는 하등 관련이 없지. 그래도 그 무심한 존재 때문에 우리의 이별 자리가 더 가슴 아리는 건 어쩔 수 없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과도 모란과도 또 낙양성 봄바람과도 여한 없이 이별할 수 있을까. 술도 새로운 이별가도 아니라면 이 봄날을 만끽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모란을 실컷 즐기고 나면 쉬 봄바람을 떠나보낼 수 있듯이, 이 순간 우리의 정을 원 없이 나누는 게 최선의 방도가 아니겠는가.
‘고운 임’이라 불렀대서 꼭 술자리의 흥을 돋우는 꽃다운 미녀만은 아닐 테고 동료이거나 절친일 수도 있겠다. ‘이별가로 새 노래를 짓지 말라’거나 ‘낙양성 모란이나 실컷 즐기자’는 살가운 말투로 보면 그렇다. 외견상 7언 율시와 같아 보이지만 이 작품은 ‘옥루춘’이라는 곡조에 맞춰 가사를 메운 사(詞)다.
이준식의 한시 한 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성갑의 공간의 재발견
구독
-

HBR insight
구독
-

발리볼 비키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무희 예찬[이준식의 한시 한 수]〈205〉](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3/23/118489398.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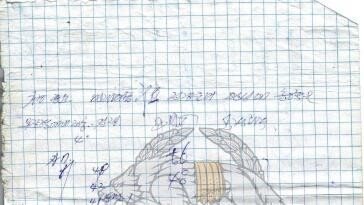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