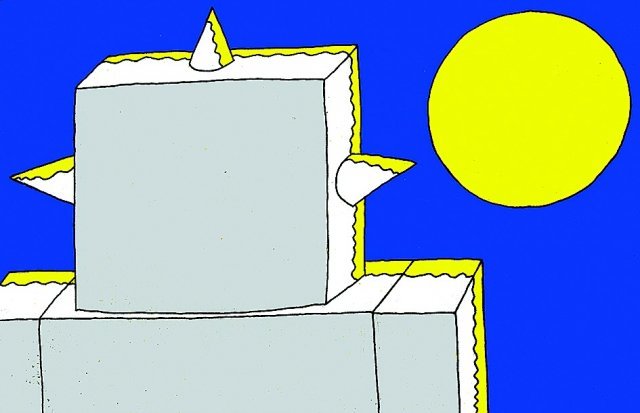

그 불안한 시국에도 나는 그림 그리는 동아리에 들어가 그림 그리기를 즐겼다. 뭐가 되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냥 좋아서 시작한 취미생활이었다. 암울한 세상은 세상이고, 내 안의 빛을 비춰줄 또 다른 밝은 세상이 필요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림 그리기는 내겐 또 다른 열정의 세계였고, 세상을 직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곡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안겨주었다. 그 당시 세상을 핑계 삼아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다면 지금 취미 없는 삭막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에게 있어 그림 그리기는 물리학이 준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림은 나에게 또 다른 우주였다. 단지 위안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닌, 더 잘 그리고 싶은 열망이 나를 그림의 세계로 이끌었다. 물리학이 주는 성취의 기쁨도 있지만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예술적 기쁨을 알았다는 것은 암울한 대학 시절에 내가 손에 쥔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다.
유학 시절, 나는 영국의 록밴드 퀸의 노래를 들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는 천체물리학자였다. 그는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에 진학해 천체물리학자를 꿈꾸며 박사 과정을 밟던 중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록밴드 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성공적인 밴드 활동에도 천체물리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2002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7년 근 30년 만에 완성된 논문으로 천체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5월에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에게 천문학과 기타의 세계는 빛의 속도로 달리는 별빛만큼 가깝지 않았을까?
동아리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생들의 외침 사이를 지나치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남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직선으로 무작정 좇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색다른 예술적 시선으로 본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좇아갔으면 한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이런 시선과 공동체 의식을 배운다면 그들의 세상이 올 땐 아마도 지금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멋진 세상이 돼 있지 않을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아주 사적인 주말 [이기진 교수의 만만한 과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4/14/118830878.2.jpg)




![[오늘과 내일/김승련]한덕수 대행은 왜 탄핵을 자초했을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41985.1.thumb.png)
![전 세계서 규제 잇따르는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실효성 있을까[글로벌 포커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4195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