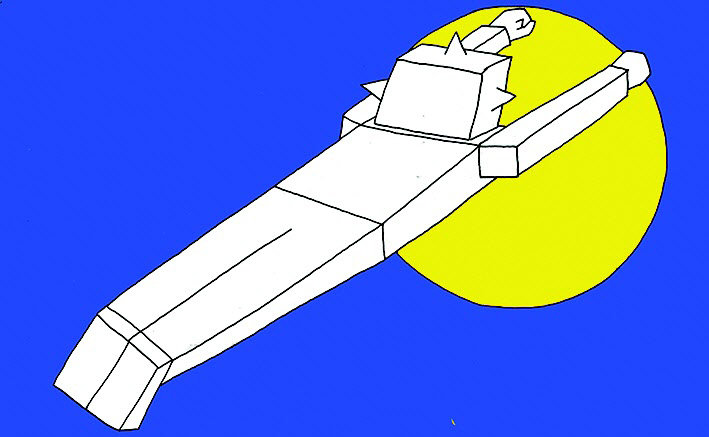

출근하면 연구원 모두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반갑게 악수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친절히 도와주고는 서둘러 자기 일에 몰두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이 전부였다. 한 시간 반의 점심시간이 오후 전투를 위한 휴전의 시간이자 토론의 시간이었다. 점심을 먹고는 퇴근 시간까지 결승골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처럼 몰입해 일을 했다. 이런 연구실 분위기가 마치 소음이 사라진 금속의 표면처럼 느껴졌다.
금요일 오전 지도교수가 진행하는 세미나장은 전쟁터였다. 일주일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지도교수가 비평을 했고 서로 토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구 끝에 가도 끝내지 못할 숙제를 떠안고 모두들 각자의 책상으로 사라졌다. 이런 냉정한 연구실 풍경이 나에게는 기댈 곳 없는 외로운 들판같이만 보였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연구원들은 다시 악수하고 구릿빛 얼굴로 연구실 책상에서 마치 일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주말의 일들을 자랑하기 바빴다. 바이크, 등산, 캠핑, 요트, 여행. 나는 기숙사에서 밀린 일주일 치 빨래를 했고,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뭔가를 해야만 내 삶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처럼 주말을 지냈다. 현실을 맴돌기만 하는 이방인이었을까? 30년 전 유학생 시절의 이야기다.
이젠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려고 노력한다. 주말은 나만을 위해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운동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한다. 되도록 연구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노력한다. 이젠 학생들 역시 주말엔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다. 학생들을 기다릴 이유가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연구가 되는 시절은 지났다. 세상이 바뀌었고, 근본적으로 연구 시스템이 바뀌었다. 30년 전 최첨단을 달리던 프랑스 노르망디 작은 연구소 시스템이 이제 우리 학계에도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아인슈타인을 가르치는 심정으로[이기진 교수의 만만한 과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5/04/11915038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