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낙사고라스는 소아시아의 클라조메나이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스무 살부터 30년 동안 머문 아테네가 더 고향 같은 도시였다. 그는 이 이름난 도시에서 유력 인사들과 교류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아고라의 가판대에 놓인 그의 책은 아테네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젊은 소크라테스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숙련공 하루 일당에 이르는 비싼 책을 살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낙사고라스의 책을 읽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특히 자연 질서의 기원에 대한 주장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사물의 생성과 소멸은 없다”
아낙사고라스가 자연을 탐구하면서 마주한 과제는 당대 다른 철학자들의 고민거리와 똑같았다. 파르메니데스의 아포리아를 푸는 일이었다. 있는 것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없는 것은 애당초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는 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은 생성과 소멸의 현상들로 가득하다. 그렇다면 ‘없는 것’의 있음을 가정함이 없이 자연물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질문이 같으면 대답의 패러다임도 같아지기 마련이다. 변화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원리들을 가정하고 이것들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것이 아포리아를 푸는 길이었다. 그런 뜻에서 아낙사고라스는 “어떤 사물도 생겨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있는 사물들로부터 함께 섞이고 분리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해 낸 ‘있는 사물들’은 엠페도클레스나 데모크리토스가 가정한 것들과 달랐다. 아낙사고라스는 흙, 물, 불, 공기나 더 쪼갤 수 없는 원자들이 아니라 저마다 고유의 성질을 가진 ‘씨앗들’을 만물의 원리로 내세웠다.
자연은 ‘씨앗’이란 원소로 이뤄져

하지만 아낙사고라스가 만물의 원리로서 씨앗의 존재를 가정하는 데 그쳤다면, 그는 젊은 소크라테스의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형태의 요소 이론은 이미 다른 철학자들이 세운 이론의 다른 버전에 불과하니까. 아낙사고라스의 책이 사람들의 흥미를 끈 진짜 이유는 그 안에 새로운 생각, 즉 씨앗들의 결합과 분리를 일으켜 우주의 질서를 낳는 원리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철학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신(nous)’ 혹은 ‘질서의 부여자’에 대한 이론이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씨앗들의 최초 상태를 상상해 보자. 온갖 씨앗이 뒤섞인 상태에서는 아직 자연물들의 형태도, 성질들의 차이도, 자연의 질서도 없다. 카오스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의 우주는 코스모스이다. 저마다 성질이 다른 자연물들이 일정한 관계를 이루며 질서 있게 운동한다. 그렇다면 카오스는 어떻게 코스모스로 바뀌었을까? 아낙사고라스에 따르면 그 시작에는 회전 운동이 있다. 함께 뭉쳐 있던 씨앗들 사이에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씨앗들이 분리되었다. 하지만 아낙사고라스가 보기에 이 운동은 우연 탓이 아니었다. 그 운동을 낳은 것은 “함께 섞이는 것들과 떨어져 나오는 것들, 그리고 분리되는 것들을 모두 알고 있는” 정신의 힘이기 때문이다. “장차 있을 예정이었던 것들, 지금은 있지 않지만 있었던 것들, 지금 있는 것들, 장차 있게 될 것들, 이 모든 것에 정신이 질서를 부여했다.” 아낙사고라스는 새로운 질문과 대답으로 또 한 차례 사고 혁명을 이뤄냈다.하지만 혁명이 항상 진보를 뜻할까? 반동적 혁명도 혁명이라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자연에 ‘정신’을 도입한 아낙사고라스의 혁명은 학문의 진보인가 퇴보인가? 생명과 인간의 마음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물리 현상으로 보고 그것들을 물질의 운동으로 설명하려는 주류 과학의 눈에는 아낙사고라스의 혁명이 퇴보로 보일 수 있다. 그런 입장의 옹호자들은 아낙사고라스보다, 물질적 입자들의 우연한 충돌과 그 결과로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 했던 원자론을 더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 환원주의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오늘날에도 그치지 않는다.
자연현상을 ‘정신’을 통해 풀어내다
모든 것이 물질 현상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생명 없는 물리 현상과 ‘정신’이나 ‘마음’에 해당하는 물리 현상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 그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들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 지금도 ‘아낙사고라스의 후예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 미국 철학의 대표자 토머스 네이글도 그렇다. 그는 ‘정신과 코스모스(Mind & Cosmos·2012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 정신은 불가해한 사건 혹은 어떤 신적이고 변칙적인 선물이 아니라 자연의 기본 측면이다. 정통을 자처하는 현대과학의 내재적 한계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자연의 그런 측면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사회 질서와 달리 자연 질서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자연 질서의 본성이나 기원에 대한 질문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인가?’ 물론 상관없을 수 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하기 어렵다. 질문과 상상이 없으면 사회 질서도 자연 질서처럼 여기는 순응적 태도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질문에는 숨 막히는 질서의 압박 속에서 숨통을 터놓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 과학에서도, 일상에서도 질문은 곧 자유다!
조대호 신화의 땅에서 만난 그리스 사상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공포심이 일으키는 전쟁,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반복된다[조대호 신화의 땅에서 만난 그리스 사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6/02/119590364.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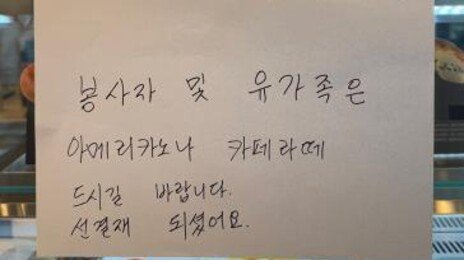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