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이던 그는 고양이를 담은 바구니를 안고 아버지가 모는 자전거 뒤에 타고 있었다. 그들은 2km쯤 떨어진 해변에 고양이를 버리러 가는 길이었다. 20세기 중반에는 고양이 유기가 그다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 버린 이유는 모른다. 집에 들어와 사는 암고양이의 배가 불러오자 새끼들까지 키워야 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였을까. 여하튼 그들은 고양이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해변에 버린 고양이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고양이가 자전거로 돌아온 그들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리둥절했던 표정은 곧 감탄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이후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버지를 회상하며 쓴 ‘고양이를 버리다’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의 집에는 고양이가 늘 있었다. 형제가 없던 그에게 고양이는 “소중한 친구”였다.
그는 고양이를 버린 기억을 떠올리다가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문득 떠올린다. 버림받은 고양이와 버림받은 아버지. 그의 아버지 세대에는 먹을 것이 충분치 않으면 자식을 양자로 보내거나 절에 맡기는 일이 더러 있었던 모양이다. 할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어떤 절의 동자승으로 보냈다. 그런데 아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후로 집에서 살았다. 그러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가 하루키의 아버지다.
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노후, 어디서 살까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하나의 불가사리를 위하여[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296〉](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5/24/119446236.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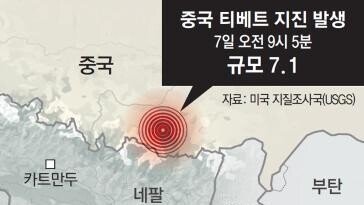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