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국유사’를 지은 고려시대의 승려 일연은 대부분의 삶을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어도 효자였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삼국유사’의 마지막에 부모와 자식 이야기를 배치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의 손을 거치며 감동이 더해졌다.
지은(知恩)이라는 이름의 딸이 나온다.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너무 가난한 탓에 동냥을 해서 어머니를 부양한다. 그런데 지독한 흉년이 들어 그것마저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자 그녀는 어느 부잣집에 몸을 팔고 종이 되어 어머니에게 쌀밥을 해드린다. 며칠 후 어머니가 말한다. “전에는 거친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했는데 요즘은 좋은 쌀밥을 먹는데도 창자를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은데 어찌 된 일일까.” 딸이 사실대로 얘기하자 어머니는 통곡한다. “네가 나 때문에 종이 되었다니 내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어머니도 울고 딸도 운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없는 대목이 나온다. “딸은 어머니가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으나 돌아보니 오히려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기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딸이 종이 된 것을 자책하며 울고, 딸은 향갱(香秔) 즉 맛있는 밥보다 강비(糠粃) 즉 겨와 쭉정이로 된 거친 음식을 먹을 때가 마음이 더 편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운다. 어머니에게는 딸이, 딸에게는 어머니가 먼저다.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문법이랄까.
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아파트 미리보기
구독
-

지금, 이 사람
구독
-

건강 기상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거미 가족을 위하여[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302〉](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7/04/120079053.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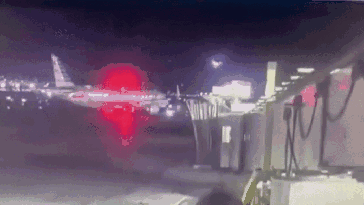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