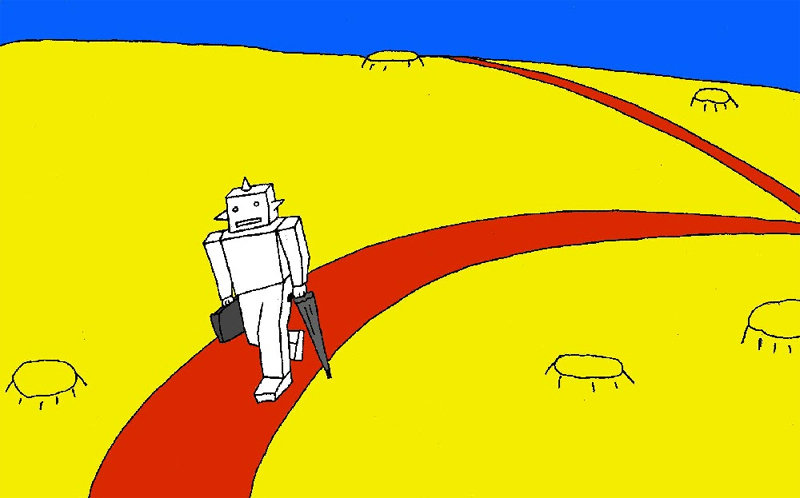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방학이 시작되니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 시작점에 잠 못 이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의 1년 반 동안 고생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써서 저명한 국제 저널에 투고했는데 그만 거절당한 것이다.

논문을 투고하면 3명의 심사위원이 논문을 검토한다. 물론 누가 심사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논문을 해부한다는 것이 딱 맞는 표현 같다. 3명이 논문을 샅샅이 검토하고 연구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일종의 검증 시스템이다. 이 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논문은 세상에 나올 수 없다.
며칠을 끙끙 앓고 지내다가 그래도 다시 시작해 봐야지, 하고 있다. 논문이 통과되었다면 즐거움에 들떴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움의 시간은 순간이다. 하루 이틀. 항상 이런 즐겁거나 괴로운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다. 물리학자의 숙명처럼.
과학적 검증엔 예외가 없다. 아인슈타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인슈타인은 거대한 중력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중력파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틀린 수학적 계산을 믿고서는,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에 중력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투고한 적이 있다.
수학적 오류를 검토한 편집장은 이 논문을 거절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아인슈타인은 홧김에 다시는 이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최고의 물리학자에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후에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아인슈타인은 다시금 정중히 사과했다. 이 또한 과학적 과정의 하나다. 이런 검증 과정이 과학을 지탱하는 축 아닐까? 참고로 중력파는 2015년 9월 지구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었고, 중력파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물리학자들은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물리학자의 ‘버드워칭’[이기진 교수의 만만한 과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7/27/120453382.2.jpg)


![동해 목선 탈북 1호, 강원 JC 회장이 되다[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66951.2.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