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이번 홍수 피해를 계기로 지난 정부가 환경부로 이관한 물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전엔 국토부가 수량 관리를 통한 홍수·가뭄 예방 업무를 해왔는데 수질 관리를 하는 환경부가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까지 맡은 후로 장마철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넘기라”며 환경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정부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후 큰 수해가 날 때마다 환경부의 치수 역량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이 된 미호강을 비롯해 지역 하천 170곳의 제방이 유실됐다. 2020년 장마 때는 섬진강댐 수위를 미리 낮추지 않아 16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하지만 국토부가 물 관리를 할 때도 크고 작은 수해는 있었다. 환경부가 하천 관리까지 하게 된 것도 2018년 역대 최장 장마로 물난리가 난 것이 계기였다. 국토부로 물 관리 업무를 재이관한 후 수해가 나면 그땐 또 누구 탓을 할 건가.
현재 환경부에는 국토부에서 물 관리 업무를 하던 공무원 300명이 넘어와 일하고 있다. 환경부의 치수 역량이 문제라면 ‘국토부로 원상 복귀’를 주장하기 전에 조직 관리와 예산 배분에서 수량과 수질 관리라는 물 관리 목표 간 균형을 잡고 있는지 점검해 개선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환경부와 국토부를 오락가락하면 안정적인 물 관리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행복 나눔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권위주의로 퇴행 기도한 尹, 뭘 하려고 했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25/13072510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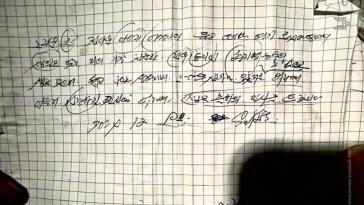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