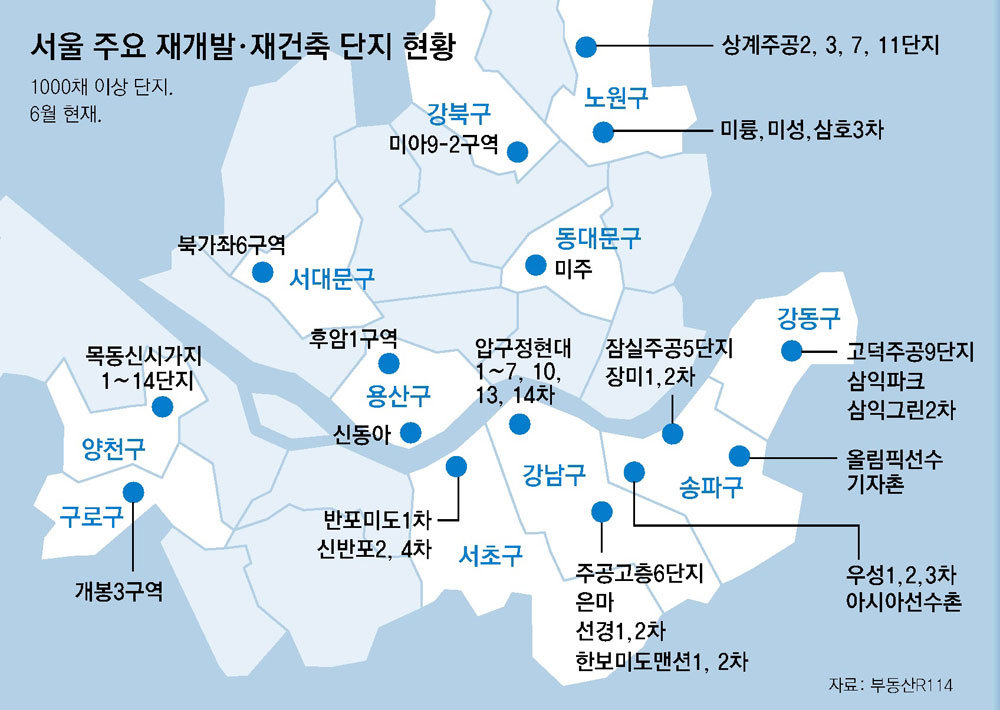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집값 회복과 규제 완화 분위기를 틈타 편법이 판치는 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설계·시공 수주를 위해 현행 기준을 무시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낚시성 계획안’이 난무한다. 이를 방치하면 도시 곳곳에서 난개발을 부추겨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고, 집값 상승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공모 절차 중단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어 설계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용적률 300% 상한을 무시하고 360%까지 높이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섞어 짓지 않고 공공보행로를 단지 외부로 우회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 기여도 무력화했다. 총회 당일 용적률을 300%로 하향한 안을 다시 냈지만 서울시는 공모가 무효라며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에선 고도제한인 90m를 넘어서는 118m 설계안을 내세운 시공사가 선정됐다. 서울시의 고도지구 완화를 전제로 해놓고 ‘배짱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정비계획을 정한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뒤늦게 임대주택 비중이 너무 높다며 계획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고 수익성을 앞세워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적 추진은 필요하다.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개별 사업이 도시계획의 큰 틀 속에서 조화롭게 추진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사설]감당 어려운 의대 증원에 N수생 최다… 초유의 혼란 속 수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14/130432175.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