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뉴멕시코주 벨렌의 아코사 윈드타워에서 경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10. [벨렌=AP/뉴시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3/08/11/120661008.1.jp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첨단반도체 등 3가지 핵심 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등은 1년 뒤부터 최신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와 슈퍼컴퓨터, 양자센서 등 분야의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월가(街) 큰손 투자사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민간 투자까지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대중 반도체 장비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자본 유입마저 원천 차단하는 강경 조치다. 미래 첨단기술을 타깃으로 중국으로 가는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중국을 겨냥한 해외투자 심사 강화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투자사의 자금이 끊기면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합작회사 명분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를 끌어낸 뒤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시도도 불가능해진다. 중국 기술기업과 미국의 자본력이 결합한 글로벌 수익 모델이 사라지는 셈이다.
규제 수위를 조절한 듯한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당초 검토됐던 바이오와 친환경 분야가 빠졌고, 주식과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는 여전히 가능하다. 향후 세부안에서 ‘최첨단 기술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기업’만 대상이 될 것이란 외신 보도도 나왔다. 투자 금지 대상이 중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한정될 것이란 의미다. 그렇더라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들이 기술 혁신을 받쳐줄 자금 실탄을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대중 ‘디리스킹’ 여파는 서서히, 장기적으로 몰려올 것이다. 특정 조치를 단편적으로 떼어내 “국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식의 분석을 내놓는 것은 섣부르다. 수십 년간 지속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공존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경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탈(脫)중국 해외 자금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확충하는 등 변화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는 역량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사설]감당 어려운 의대 증원에 N수생 최다… 초유의 혼란 속 수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14/13043217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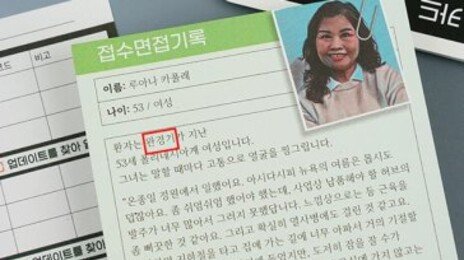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