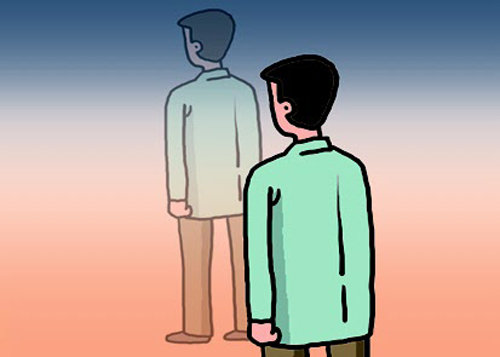
‘너는 존재한다―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그러므로 아름답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두 번은 없다’ 중

책은 언뜻 단단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물질과 비물질, 존재와 비존재를 오가는 기묘한 성질이 있다. 작가의 사유와 서사가 손에 잡히는 책으로 변한다. 책은 독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변해 사막에 뿌린 물 한 컵처럼 사라진다. 반복은 없다. 내가 읽은 책과 네가 읽은 책이 다르고, 몇 년 전 읽은 책은 오늘 읽은 책과 또 달라진다.
기묘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늘 그렇듯 책과 책 만드는 일은 신비롭고 아름답다. 변주하되 반복하지 않는 문장들이 물결처럼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우리는 결코 어제와 같을 수 없다. 사라지고 달라지기에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비록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달라도 어깨동무하며 일치점을 찾아보자고 말하며 끝나는 시처럼, 읽는 이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아름다운 물방울들을 상상하며 오늘도 기쁘게 사라지고 있다. 심보르스카도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일론 머스크의 몰아치기[내가 만난 名문장/안진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10/22/121788308.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