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들의 ‘출산파업’… OECD 최저 출산율
“집값-사교육-근로문화 고차함수 풀어야”

미국에서 아이 키우는 친구들은 한국에 오면 놀란다. 한국은 출산휴가는 물론 육아휴직이 보장됐고, 정부 지원이 많다는 이유다. 미국은 베이비시터를 쓰려면 월 400만 원은 들고 유치원(주 5일 기준) 역시 월 100만∼200만 원은 거뜬히 내야 한다. 육아휴직이란 것도 없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올해 출산 가구는 최대 4300만 원에 육박하는 영유아 지원금을 받는다.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이다. 2012년(최고 2500만 원)보다 약 1.7배로 늘었다. 내년부턴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면 반년간 최대 월 90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추락을 거듭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이대로라면 30∼40년 뒤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가 연금 고갈 시기를 당기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성장률까지 갉아먹고 있다.
돈을 퍼붓다시피 하는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주거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자녀가 있는 집의 3분의 1 정도는 결혼 전 이미 자가를 보유했다. 이들은 주택 선정 기준 1위로 학군을 들었다. 집값이 치솟아 주택 보유 자체가 어려워졌는데, 이 주택도 좋은 동네에 있어야 하므로, 출산 전부터 장벽이 높다.
여기에 육아기 부모의 ‘시간 빈곤’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라는 오명답게 퇴근 후 아이 돌볼 시간이 적다. 아이와 커리어 모두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둘은 상충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전문적 직군일수록, 지체 없이 대응하는 온콜(on-call)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커리어 성취도, 나아가 연봉까지 달라진다고 했다.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발선이 같아도 아이가 커 나가며 부부 중 1명은 회사에, 또 다른 1명은 집에 온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일하다 아이가 열나니 집에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고 뛰쳐나가는 이 1명은 조직에서 나가든지 올라가든지(up-or-out)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출산이 사치재에 가깝게 되며 Z세대들에게 출산은 거대한 도전이 됐다. 오죽하면 ‘출산이 무책임하다’는 자조가 나온다. 아이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으니, 낳지 않는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해 ‘절망의 나라, 행복한 딩크족’이 되겠다는 것.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2006년부터 300조 원 넘게 투입했다지만, 개인으로선 출산으로 감당할 직간접 비용이 지원금보다 많으니 출산을 하지 않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일회성 현금 살포보다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비출산’을 택하는 Z세대 정서를 읽어내 출산-육아-교육의 보틀넥을 세심하게 뚫어줘야 한다. 좋은 일자리로 젊은 층 기반도 탄탄히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펑크 나면서 대한민국 인구 증발도 막을 수 없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머니 컨설팅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신광영]경호는 충성심이 아닌 직업정신으로 하는 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24/13071840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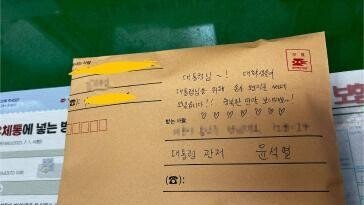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