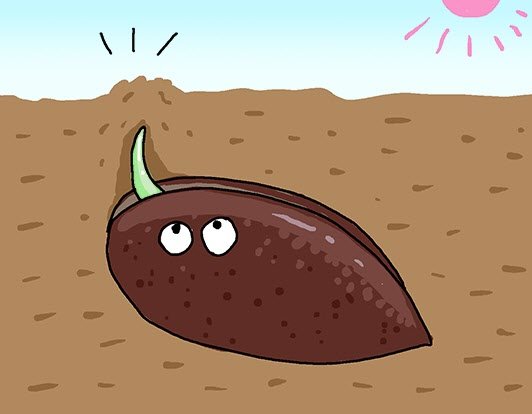
‘씨앗은 어떻게 해서 봄을 알아차릴까? 식물의 씨앗이 봄을 느끼기 위한 조건은 겨울 추위다. 겨울의 낮은 기온을 경험한 씨앗만이 봄의 따뜻함을 느끼고 싹을 틔운다.’
―이나가키 히데히로 ‘전략가, 잡초’ 중

기상청은 ‘일평균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겨울이라고 정의한다. 이 기준대로면 지난달 말은 분명 겨울이었다. 극지에서 내려온 찬 공기에 한낮에도 수은주는 영하에 머물렀고, 긴 패딩을 입고 있어도 몸이 떨렸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날이 풀리더니 9일엔 13도에 육박했다. 봄 중에도 늦봄 같은 따뜻함이다.
지난 주말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다. 이번에도 극지 찬 공기가 원인이란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극 한파가 가세해야 비로소 겨울다워진다는 얘기다. 섣불리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들은 어떻게 되려나…. 온몸으로 시간을 터득한 식물도 착각할 정도로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진정한 리더[내가 만난 名문장/사라 수경]](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12/24/122762367.2.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