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벽이 무너지고, 유빙들이 바다 덮고…
자연에 적응하고 싶은 존재에 불과한 나
발로 뛰는 과학자들이 만든 데이터에 감사

어제는 꿈을 꾸었다. 동네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상적 풍경에 관한 것이었다. 오거리의 복잡한 차선들, 군림하듯 서 있는 빌딩들, 바쁜 걸음의 사람들. ‘남극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구나’ 꿈에서 생각했고 차디찬 아쉬움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런데 눈을 뜨자 당연히 남극이었다. 그 순간 몰려드는 안도감, 나는 지금은 이곳이 내 집이구나 생각했다.
남극 세종기지에서 2월을 보냈다. 한국은 봄기운이 조금씩 느껴진다는데 여기는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로 넘어가고 있다. 날씨를 기준으로 한다면 남극의 하루는 시시각각 다른 날들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만 해도 안개가 껴서 기지 앞 맥스웰만이 전혀 보이지 않더니 오전이 지날 즈음에는 모두 걷혀 외부 활동을 나갈 준비를 하게 됐다. 하지만 “이역만리 남극에 맛과 멋을 전하는” 남극 1호 식당 ‘세종회관’에서 청국장을 먹는 사이 파도가 높아져 다이빙팀은 활동을 접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은 비가 내린다.
이곳에서 우리는 날씨의 지배를 받는다. 요일과 날짜 구분은 의미가 없고 바람, 물, 하늘, 공기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한다. 설 연휴에도 당일을 빼고는 매일 과학자들을 따라 현장으로 나갔다. 이곳에 와서 나는 ‘필드 과학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들은 탐험가와 과학자와 등산가와 몽상가를 합친 독특한 이들이었다. 100kg의 장비를 나눠 든 채 수십 km를 오가고 세상 티끌보다 작은 이끼를 분석하기 위해 종일 땅바닥에 붙어 있기도 한다. 전 세계 기상학자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센서를 장착한 풍선을 띄운다는 것도 처음 안 사실이었다. 우리가 간편히 확인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그들의 발자국이 만들어 낸 장엄한 기록이었다.
과학자들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 하루도 실내에 있지 않았다. 먼 거리와 무거운 짐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었고 그렇게 해서 모은 데이터가 이룰 미래의 가치를 신뢰했다. 영화에서 흔히 그리듯 신기술을 이용해 자본과 결탁한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으리라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다. 그들은 남극 대륙을 다니며 이 세계를 해석할 소중한 진실을 구하고 있었다. 나는 곧 그들의 활기에 젖어 들었고 아무리 피곤한 날을 보내도 다음 날이면 쌩쌩했으며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열렬한 흥미를 느꼈다. 간단히 말해 너무나 행복했다.
3주가 지난 지금, 나도 꽤 남극인의 면모를 갖게 되었다. 섬에 위치하는 세종기지는 고무보트의 일종인 조디악을 타고 이동할 때가 잦은데, 파고가 높아도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어제 중국의 장성기지 생일을 맞아 축하 사절단으로 바다 건너 필데스 반도를 찾았을 때 동승했던 G 총무가 “이제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시죠?” 하고 물었다. 두 발로 버티고 있어도 엉덩이가 들썩이는 조디악 위에서 나는 “그럼, 당연하죠” 하고 외쳤다.
고무처럼 두껍고 질긴 질감으로 팽팽하게 움직이는 남극해, 멀리 숨을 쉬러 나오는 고래의 등, 윌슨바다제비가 한참을 따라오며 우리 조디악과 경주를 했다.
동아광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딥다이브
구독
-

벗드갈 한국 블로그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박원호]포스트 계엄 세대의 탄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06/130803686.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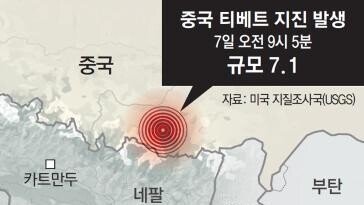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