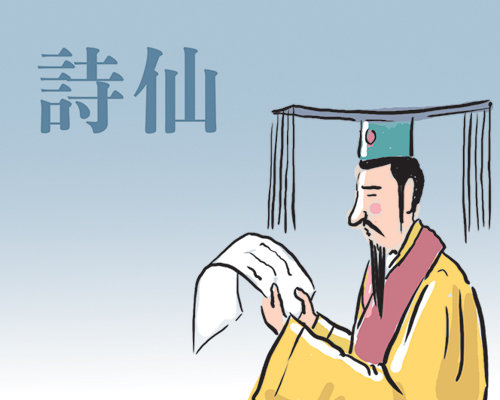
주옥같은 시문을 지어온 60년, 누가 그댈 죽음의 길로 몰아 시선(詩仙)이 되게 했나.
떠도는 구름처럼 얽매이지 않았기에 이름은 거이(居易), 무위자연의 삶을 좇았기에 자가 낙천(樂天).
어린애조차 그대의 ‘장한가(長恨歌)’를 읊어대고, 오랑캐도 ‘비파행(琵琶行)’을 부를 줄 알았지.
(綴玉聯珠六十年, 誰敎冥路作詩仙. 浮雲不繫名居易, 造化無爲字樂天. 童子解吟長恨曲, 胡兒能唱琵琶篇. 文章已滿行人耳, 一度思卿一愴然.)―‘백거이를 애도하다(조백거이·弔白居易)’·당 선종(宣宗·810∼859)
한 시인이 죽어서 ‘시선’이 되었으리라 평가한 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애도사(哀悼辭)이리라. 원래 이 칭호는 이백의 탁월한 시재를 상징하는 대명사로만 쓰였는데 말이다. 하물며 그 애도의 주체가 황제의 신분인 바엔. 백거이가 사망한 지 얼마 후 즉위한 선종이 고인의 문학적 성과와 삶의 궤적에 대해 보낸 찬사는 실로 구체적이다. 우선 60년 창작의 성과를 ‘주옥같다’는 한마디로 요약했다. 그중 대표작은 어린애나 이방인까지도 입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친숙하고, 누구든 길을 걷다 보면 접할 수 있는 게 또 고인의 작품이라고 찬탄했다. 뿐이랴. 이 시에서는 무위자연의 도가적 삶을 지향하면서 세속의 명리에 초연했던 고인의 낙천적 성품까지 우러르고 있으니 최상의 예우를 갖춘 추념(追念)의 시로 손색이 없겠다.
시인에 대한 당 황제의 예우가 각별했던 사례는 부지기수. 여황제 무측천(武則天)은 신하들과의 나들이에서 황포(黃袍·곤룡포)를 상으로 내걸고 시재를 겨루게 했고, 현종(玄宗)은 이백의 시재에 반하여 즉석에서 관리로 발탁했다. 헌종(憲宗)은 백거이 시의 현실성을 높이 사 외직에 있던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다.
이준식의 한시 한 수 >
구독 139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133
-

선넘는 콘텐츠
구독 22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6
-
- 좋아요
- 5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봄을 기다리며[이준식의 한시 한 수]〈256〉](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3/21/124097964.1.jpg)



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2024-03-15 17:40:20
路도 하늘 가는 길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천당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한자에서 路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치원의 “世路少知音”의 世路도 路의 의미없이 그냥 “세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시문은 엄격한 율격으로 인하여 번역이 오히려 제한되어 있습니다. 막연히 상상력을 발휘하여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학자에 다름없다고 보여지시는 한문학자라면 吐하나에 라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 했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4-03-15 17:37:34
등 주옥같은 시문들을 암송하고 있으니 지금 저승(冥路)에 있어도 시선이라고 불리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 것을 “누가 그댈 죽음의 길로 몰아 시선이 되게 했나” 라고 번역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번역을 한다면 “어느 누가 (백거이) 그대가 저승에 있음에도 시선으로 불리(되)게 했나?” 명로(冥路)는 글자 그대로는 저승가는 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저승이나 저세상이라고 번역하여야 하고 사전에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天路歷程의 天路도 하늘 가는 길의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천
2024-03-15 17:36:15
좋은 한시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나 起句에 해당하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한 해석문제입니다. 誰敎冥路作詩仙. 누가 그댈 죽음의 길로 몰아 시선(詩仙)이 되게 했나.”에서 문형 분석을 해 본다면 주어(誰) + 사역동사(敎) + 목적어(백거이)는 생략 + 冥路(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 동사(作) + 시선(詩仙)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어(誰)는 특정되지 않은 이승의 사람들입니다. 즉 이승의 모든 사람들이 백거이가 60여년 주옥같은 시문을 남기고 저승으로 갔는데도 죽은 후인 지금도 모든 이들이 장한가나, 비파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