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기시대 유물에도 파묘 흔적
《무덤은 참 역설적인 존재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눈물로 떠나보내는 이별의 장소인 동시에 귀신이나 심령현상이 떠오르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영화 ‘파묘’가 인기를 얻으면서 무덤을 둘러싼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무덤을 이장하거나 몰래 다른 관을 묻는 등 낯설어 보이는 수많은 풍습은 수천 년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것이다. 파묘라는 금기시되어 있는 풍습의 기원을 인간의 삶을 탐색하는 고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


성인 유골 파내 숭배한 중세 서양
인골 자체를 숭배하는 풍습은 중세 서양이나 중남미로도 이어졌다. 특히 해골 숭배 사상이 특별히 발달한 아스테카문명에서는 해골에 화려한 보석과 황금을 붙여서 아름답기까지 한 예술품을 만들었다. 서양 중세 시대는 더욱 극적이다.
서기 9세기에 기독교를 보급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왕은 우상을 믿던 이교도들의 개종을 위해서 성인의 유골에 믿음의 서약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각 교회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성인의 유골’이라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훔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성인이 갑자기 늘어날 리 없으니 나중에는 공동묘지에서 엉뚱한 유골을 파서 성인으로 둔갑시켰다. 지금 같은 유전자 검사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주로 해골에 집착하는 반면에 한국은 땅에 집착한다. 조상의 유해 자체는 터부시하고 그 대신에 좋은 곳에 무덤을 만들어서 시신이 곱게 자연으로 돌아가면 후손들이 발복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골보다는 그들의 유택(幽宅)을 중시하는 풍수 사상이 발달하는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지리 지형의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역은 산성이 매우 강한 토양인지라 매장을 하면 인골은 빠르게 풍화한다. 삼국시대 고분의 경우도 수백 개를 파도 제대로 된 인골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풍수 사상은 한국이라는 풍토에서 독특하게 발달해 온 역사를 가진 셈이다.
다른 사람 묫자리 가로채기까지
무덤과 인골에 대한 믿음은 심지어 다른 사람의 묫자리를 가로채거나 다른 무덤을 함께 넣는 풍습으로도 이어진다. 유명인이나 귀족의 무덤을 재단장할 때 슬쩍 자기의 조상 인골로 바꿔치기하거나 자기 가족의 사주를 넣어서 자손이 흥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린다.
‘첩장’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풍습도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어서 고고학에서는 ‘추가장’ 또는 ‘배장’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다. 예컨대, 약 2500년 전 알타이 초원에서 살던 족장들이 남긴 쿠르간(대형 고분)의 근처에서는 예외 없이 작은 무덤들이 발견된다. 스키타이문화가 사라지고 1000년 가까이가 지난 직후 소규모로 쪼개져서 살던 튀르크(돌궐) 계통의 주민들이 만든 것이다. 자기들이 거대한 무덤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 큰 고분의 영험한 능력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무덤을 끼워 넣은 것이다. 반면에 높은 권력을 지닌 왕들은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빼앗기도 한다. 18세의 어린 나이에 죽은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이 그러하다. 왕권이 약했던 투탕카멘은 자기의 묫자리도 제대로 못 만들고 죽었다. 그 바람에 다른 귀족이 잡아놓고 준비했던 무덤에 대신 들어가기도 했다.
‘배장’이라는 풍습도 있는데, 이것은 왕이나 주군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그 부관들을 주변에 함께 묻는 것을 말한다. 흉노의 왕인 선우의 대형 무덤에는 주변에 수십 개의 배장묘가 함께 발견된다. 죽어서도 주군을 지키라는 바람인 것이다.
파묘, 이장… 죽음 체화하는 과정
왜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게 되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삶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삶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담아 무덤을 만들고, 먼저 간 이들을 기억하는 축제인 제사를 지내며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바로 인간의 죽음을 매장과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체화시키는 과정이 무덤이다. 우리가 때만 되면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무덤의 발굴이 고대인들의 삶에 접근하는 1차 자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러시아 화가 플라빈스키는 중앙아시아의 버려진 이슬람 묘지를 거닐면서 “공동묘지의 언덕 위에서 영생을 갈구하던 영혼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무덤을 만들고 다시 파묘를 하는 그 죽음을 대하는 과정의 본질은 결국 삶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
강인욱 세상만사의 기원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e글e글
구독
-

정기범의 본 아페티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4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교의 장’ 목욕… 인더스 유역엔 공동탕, 마야엔 머드팩 사우나[강인욱 세상만사의 기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4/22/124599192.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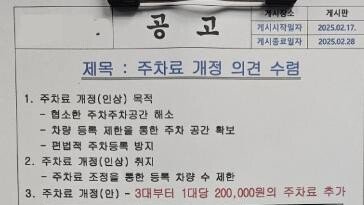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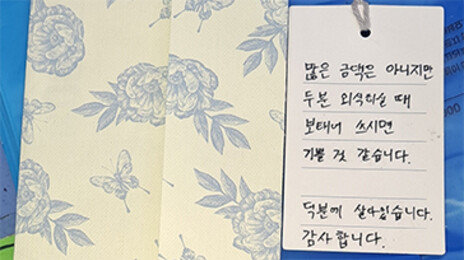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