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평사들, ELS 배상 韓 은행 수익성 경고
은행-투자자-당국 ‘위기 건망증’이 위기 불러

은행 위기의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진 ‘뱅크데믹’(은행과 팬데믹의 합성어)이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게 불과 1년 전이다.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은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지 48시간 만에 폐쇄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진화되고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은행 파산이었다.
디지털 시대엔 은행 위기가 도둑처럼 온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모바일뱅킹으로 예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디지털 뱅크런’의 위험이 작년 뱅크데믹으로 확인됐다. 뱅크런 메커니즘을 규명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5월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해 “미 SVB 파산이 한국에도 조기 경보를 울렸다”고 경고했다.
세상은 이처럼 무섭게 변하는 데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된다. 은행에서만 15조 원 넘게 팔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는 불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16년 H지수 폭락으로 ELS 투자자들이 손실 위기를 경험하고도 8년이 지나 똑같은 일이 그것도 더 큰 규모로 재연됐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이익은 내 덕, 손해는 네 탓’이라는 도덕적 해이와 책임 전가도 되풀이된다. 은행과 투자자가 시장인 ‘링’ 밖으로 나와 배상 공방을 벌이고 금융 당국이 끼어들어 배상 기준을 권고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장면은 한국 금융의 클리셰(진부한 설정)다. 한 금융 전문가는 “홍콩 H지수 ELS의 구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 중소기업 상당수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외환 파생상품인 ‘키코(KIKO)’의 개인투자자 버전”이라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6개 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했지만 진통을 겪었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H지수 ELS만큼 복잡한 배상 조정 기준을 권고했는데, 배임을 걱정해 배상을 망설이는 은행과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 사이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이러는 사이 한국 금융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한다. 이달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ELS 배상,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 영업 환경 악화 등으로 한국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의 얘기처럼 당장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긴장을 늦출 순 없다. 은행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제 자금시장에서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위기 땐 차입도 어려워진다. 부동산 시장 둔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은행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도 도사리고 있다. 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당국의 신용사면으로 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지도 걱정스럽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아파트 미리보기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건강 기상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서영아]한 시대가 끝난다는 것](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30/130758981.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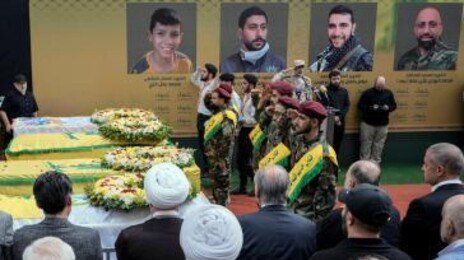
댓글 0